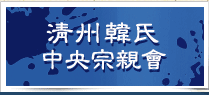|
|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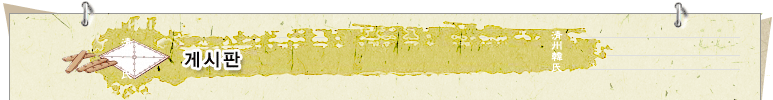 |
|
вҖ» мһҗмң кІҢмӢңнҢҗ мқҙмҡ©мӢң м°ёкі мӮ¬н•ӯ
1) нҡҢмӣҗк°Җмһ… нӣ„ кёҖм“°кё°к°Җ к°ҖлҠҘн•ҳмҳӨлӢҲ нҡҢмӣҗк°Җмһ… нӣ„ мқҙмҡ©л°”лһҚлӢҲлӢӨ.
2) кұҙм „н•ң мқҳкІ¬кіј нҶ лЎ мқҖ нҷҳмҳҒн•ҳм§Җл§Ң л¶ҲмҲңн•ң м–ём–ҙлӮҳ кҙ‘кі , мҡ•м„Ө л°Ҹ мў…мқё л“ұмқ„ 비방н•ҳлҠ” лӮҙмҡ©мқҖ
м ҲлҢҖ н—Ҳмҡ©н•ҳм§Җ м•Ҡмңјл©° л°”лЎң мӮӯм ң н•ҳкІ мҠөлӢҲлӢӨ.
|
|
гҶҚ추мІң: 0 гҶҚмЎ°нҡҢ: 1574  
|
|
|
гҶҚIP: 128.xxx.85 |
|
|
 http://www.cheongjuhan.net/
http://www.cheongjuhan.net/
н•ңнӣҲ(йҹ“иЁ“) и©©мҷҖм„ңмұ…мқҳлӮҙмҡ©
в—ҺмӢ мҰқлҸҷкөӯм—¬м§ҖмҠ№лһҢ м ң42к¶Ң нҷ©н•ҙлҸ„(й»ғжө·йҒ“) л°ңн–үл…„лҸ„ мқҙн–ү(п§ЎиҚҮ)1969л…„
мҡ°лҙүнҳ„(зүӣеіҜзёЈ) гҖҺмӢ мҰқгҖҸгҖҗк¶ҒмӢӨ(е®®е®Ө)гҖ‘ к°қкҙҖ(е®ўйӨЁ)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ҳ мӢңм—җ, вҖңмҷёлЎңмҡҙ к°қкҙҖм—җ лҙ„мқҙ к№Ҡкі лІ„л“ӨмӢӨ л“ңлҰ¬мӣ лҠ”лҚ°, н‘ёлҘё мӮ°мқҳ л‘җ м–ёлҚ•м—” м—¬лҚҹ.м•„нҷү 집мқҙ мһҲл„Ө. к°қмӮ¬ лӮңк°„м—җ кІҢмқ„лҰ¬ лҲ„мӣҢ лӮ®мһ мқҙ л“Өм—ҲлҠ”лҚ°, н•ң мЈјл ҙ[з°ҫ] м„ұкёҙ л№—л°ңм—җ л°°кҪғмқҙ л–Ём–ҙм§Җл„Ө.вҖқ н•ҳмҳҖлӢӨ.
в—ҺмӢ мҰқлҸҷкөӯм—¬м§ҖмҠ№лһҢ м ң42к¶Ң нҷ©н•ҙлҸ„(й»ғжө·йҒ“) л°ңн–үл…„лҸ„ мқҙн–ү(п§ЎиҚҮ)1969л…„
м•Ҳм•…кө°(е®үеІійғЎ) в—Ӣ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ҳ мӢңм—җ, вҖңл§ҢлҰ¬ кұҙкіӨ(д№ҫеқӨ мІңм§Җ)мқ„ кө¬кІҪн•ң лҲҲ[зңј]мңјлЎң мҳӨлҠҳ м•„м№Ё лӢӨмӢң лҲ„лҢҖм—җ мҳ¬лһҗл„Ө. к°•мӮ°мқҖ м№ңкө¬к°Җ лҗ л§Ңн•ҳкі , мҡ°мЈј к°„м—җ нңҙл¶Җ(дј‘жө®)лҘј л§Ўкё°л„Ө. 붓мқ„ л“Өл©ҙ мқјмІң мҲҳ(йҰ–)лҘј нңҳл‘җлҘҙкі , л„“мқҖ к°ҖмҠҙм—” кө¬мЈј(д№қе·һ)лҘј мўҒкІҢ ліҙлҲ„лӮҳ. 1л…„ к°„мқҙлӮҳ мӮ¬м Ҳ(дҪҝзҜҖ) л”°лқј, кёёмқҙ н•ңк°Җн•ң лҶҖмқҙ н•ҳмҳҖл„Ө.вҖқ н•ҳмҳҖлӢӨ.
н—Ҳл°ұм •л¬ём§‘(иҷӣзҷҪдәӯж–ҮйӣҶ) к¶Ңм§Җ 3
мһЎм Җ(йӣңи‘—)
пјҠ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ҳ пјҠмһҗм„Ө(еӯ—иӘӘ)
лӮҳмҷҖ мӣҗмЈјлӘ©мӮ¬(еҺҹе·һзү§дҪҝ) н•ң(йҹ“)кіөмқҖ мҳӨлһң көҗмқҳ(дәӨиӘј)к°Җ мһҲкі , кіөмқҳ м•„л“ӨмқҖ мқҙлҰ„мқҙ нӣҲ(иЁ“)мқҙлқј н•ңлӢӨ. н•ң(йҹ“)м”ЁлҠ” мҷ•мӢӨкіј мІҷмқҳ(жҲҡиӘј)к°Җ мһҲлҠ” м„ёмғҒм—җ л“ңлҹ¬лӮҳкІҢ нӣҢлҘӯн•ң к°Җл¬ёмқҙл©° н•ңл•Ң нҳёмЎұ(иұӘж—Ҹ) к·Җл¬ё(иІҙй–Җ)мңјлЎң мңјлңёмқҙм–ҙм„ң к·ё мһҗм ң(еӯҗејҹ)л“ӨмқҖ м•„л§ҲлҸ„ кІҪм„ң(經жӣё)мқҳ м—°кө¬м—җлҠ” л¬ҙмӢ¬н•ҳмҳҖлҠ” л“Ҝн•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нӣҲ(иЁ“)мқҳ н•ҷл¬ё мўӢм•„н•ЁмқҖ мІңм„ұ(еӨ©жҖ§)м—җм„ң лӮҳмҷҖм„ң мҶҢл…„ мӢңм Ҳл¶Җн„° лҸ…м„ңн•ҳл©° лӮ лЎң н•ңк°Җн•ң м—¬к°Җк°Җ м—Ҷм—Ҳкі лӘёмқҖ нҳёмӮ¬(иұӘеҘў)н•ң мҳ·м°ЁлҰјмқҙлӮҳ лҶҖмқҙм—җ л№ м§ҖлҠ” л§ҲмқҢкіј мҠөкҙҖмқҙ м—Ҷм—ҲлӢӨ. к°ҖмҠҙм—җ н’ҲмқҖ мғқк°ҒмқҖ лӘЁл‘җ мҳӣ м„ұнҳ„мқҳ кёҖмқҙмҡ”. мІӯл…„мқҙ лҗҳл©ҙм„ң 진мӮ¬(йҖІеЈ«)м—җ мҳӨлҘҙкі н–Ҙн•ҷ(й„•еӯё)м—җм„ң көҗмҡ°(дәӨеҸӢ)н•ҳлҚҳ лҸҷлЈҢл“ӨмқҖ мқҙліҙлӢӨ м•һм„ мӮ¬лһҢмқҙ м—Ҷм—ҲмңјлӮҳ мҳӨнһҲл Ө л¶Җм§Җлҹ°н•ҳкі кіЁлҸҢн•ҳм—¬ мҳӣ лІ•мқ„ л°°мӣҖм—җ лҚ”мҡұ нһҳмҚЁ лҢҖк¶җл¬ё м•һм—җ к°Җм„ң мһҘм°Ё мҷём№ҳл©° м•„лҰ„лӢӨмҡҙ кёҖмқ„ мҳ¬л Ө мқҙ м„ёмғҒм—җ мҳӣ лҸ„мқҳлҘј мҶҢлҰ¬м№ л§Ңн•ҳлӢӨ. н•ҳлЈЁлҠ” лӮҙ м•„л“Өмқ„ л”°лқјмҷҖ к·ёмқҳ мһҗ(еӯ—)лҘј лӮҳм—җкІҢ м§Җм–ҙ лӢ¬лқјкі н•ҳмҳҖлӢӨ. лӮҳлҠ” мҳӣлӮ кІҪмЈј(ж…¶е·һ)мқҳ мҲҳл №мңјлЎң мһҲмқ„ л•Ң н•ңкіөмқҖ лі‘л¶Җ(е…өз¬Ұ)лҘј м°Ёкі мҳҒлӮЁмўҢлҸ„(пҰ«еҚ—е·ҰйҒ“)м—җ мһҲлҠ” 진мҳҒ(йҺӯзҮҹ)м—җ мһҲм—ҲмңјлҜҖлЎң нӣҲ(иЁ“)мқҙ м„ұм№ң(зңҒиҰӘ)н•ҳкі лҸҢм•„мҳЁ кёём—җ кІҪмЈјлҘј м§ҖлӮ л•Ң к°җмӮ¬(зӣЈеҸё) м„ұмӮ¬мӣҗ(жҲҗеЈ«е…ғ)кіөмқҙ л§Ҳм№Ё мҲңмӢң(е·ЎиҰ–)м°Ё мҷ•лҰјн•ҳмҳҖмңјлҜҖлЎң н•Ёк»ҳ м Җл…Ғм—җ мқҙм•јкё°лҘј н•ҳкІҢ лҗҳм—ҲлӢӨ. мқён•ҳм—¬ мқҙм•јкё°к°Җ м „лҢҖ(еүҚд»Ј) мқёл¬ј(дәәзү©)мқҳ мҡ°м—ҙ(е„ӘпҰқ)м—җ лҜёміӨлҠ”лҚ°, нӣҲ(иЁ“)мқҖ м—ӯм—ӯнһҲ к·ё н–үн•ң мқјмқҳ н–үм Ғ(иЎҢи№ҹ)мқ„ л“Өм–ҙ мӢӯмӨ‘м—җ н•ҳлӮҳлҸ„ л№ м§җ м—Ҷмқҙ н•ҳлӢҲ лӮҳлҠ” 진мӢӨлЎң лҸ…мӢӨн•ң мҳӣ кө°мһҗмҷҖ к°ҷмқҢмқ„ м•Ңм•ҳлӢӨ. м§ҖкёҲ мқҙлҜё н•ҷл¬ёмқҙ мқҙлЈЁм–ҙмЎҢм–ҙлҸ„ мҳӨнһҲл Ө л°ӨлӮ®мңјлЎң м„ңлӢ№м—җм„ң кіөл¶Җн•ҳл©° кі мқё(еҸӨдәә)мқ„ лІ—мңјлЎң мҲӯмғҒн•ҳлҠ” мӮ¬лһҢмқҙлӢӨ. к·ёк°Җ мһҘм°Ё лІјмҠ¬ кёём—җ л“Өл©ҙ мӢңн–ү(ж–ҪиЎҢ)кіј мЎ°м№ҳ(жҺӘзҪ®)м—җ лҜёнҳ№(иҝ·жғ‘)н•ҳм§Җ м•Ҡмқ„ кІғмқ„ к°ҖнһҲ м•Ңл§Ң н•ҳлӢӨ. к·ёлҹ¬лҜҖлЎң мқҙм—җ мһҗ(еӯ—)лҘј м§Җм–ҙ мқҙлҘҙкё°лҘј мӮ¬кі (её«еҸӨ)лқј н•ҳлӢӨ. кі кёҲ мқёл¬јмқҳ к·ё кіөлӘ…кіј л¶Җк·ҖлҠ” мЎұнһҲ л…јн• кІғмқҙ м—ҶлӢӨ. к·ё н’Ҳмң„лҠ” мғҒ․мӨ‘․н•ҳ, к·ё мң (йЎһ)лҠ” м •(жӯЈ)кіј мӮ¬(йӮӘ), 충(еҝ )кіј мҳҒ(佞 : м•„мІЁ), м§Ғ(зӣҙ)кіј мӮ¬(и©җ)к°Җ мһҲм–ҙ к°ҷмқ„ мҲҳ м—ҶмңјлӢҲ, нӣҲмң (и–°蕕 : кө°мһҗмҷҖ мҶҢмқё)мҷҖ к°ҷмқҙ л№ҷнғ„к°„(ж°·зӮӯй–“)мңјлЎң л§Өм–‘ м„ңлЎң л°ҳлҢҖк°Җ лҗңлӢӨ. мӮ¬кі (её«еҸӨ)м”Ём—җкІҢлҠ” к·ё лҲ„к°Җ мҠӨмҠ№мқјк№Ң? мІӯм»ЁлҢҖ мӮјк°ҖнһҲ мқҙлҘј нғқн• м§Җм–ҙлӢӨ. к·ёмқҳ м•„лІ„м§Җ н•ң(йҹ“)кіөмқҳ нңҳлҠ” 충мқё(еҝ д»Ғ)мқҙмҡ”. лӮҳмқҳ м•„л“Ө мқҙлҰ„мқ„ м–ёл°©(еҪҰйӮҰ)мқҙлқј н•ңлӢӨ.
нҷ©н•ҙлҸ„мӮ¬ н•ңнӣҲмқ„ мҶЎлі„н• л•Ң мӨҖ мӢңмқҳ м„ңл¬ё
лӮҳлҠ” м„ұк· кҙҖмқҳ 1)мӮ¬м„қ(её«еёӯ)м—җ мһҲкё°лҘј лӘҮн•ҙ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қҙм—җ н•ңм”Ёмқё мһҗл„ӨлҠ” мқҙлҰ„лӮң 진мӮ¬лҗЁмқ„ м•Ҳм§Җк°Җ мқҙлҜё мӮ¬мҳӨл…„мқҙ лҗҳм—ҲлӢӨ. м„ мЎ°мЎ°м—җ лӣ°м–ҙлӮң м ҠмқҖмқҙлҘј кұ°л‘җм–ҙ л§ҺмқҖ м„ л№„м—җкІҢ *мұ…л¬ё(зӯ–е•Ҹ)н•ҳлӢҲ н•ңм”Ёмқё мһҗл„ӨлҘј м ң1лЎң к°Җл Ө лҪ‘кІҢ лҗҳм–ҙ, лҢҖн•ҳм—¬ ліҙлӢҲ лӘЁл‘җ л§җн•ҳкё°лҘј, гҖҺкөӯк°ҖлҠ” мӮ¬лһҢмқ„ м–»м—ҲлҸ„лӢӨ.гҖҸн•ҳмҳҖлӢӨ. м„ұмғҒк»ҳм„ң лӘЁл“ л°ұм„ұм—җкІҢ мһ„н•ҳмӢңм–ҙ *мҹҒмӢ (и«ҚиҮЈ)мқ„ кө¬н•ҳм—¬ *ліҙмқө(иј”зҝј)мқ„ мӮјмңјл Өкі н•ңм”Ёмқё мһҗл„ӨлҘј *мҲҳм„ (йҰ–йҒё)мңјлЎң л°ӣм•„ м •м–ё(жӯЈиЁҖ)м—җ м ңмҲҳн•ҳмҳҖлӢӨ. лҳҗ лӘЁл‘җ л§җн•ҳкё°лҘј, гҖҺмЎ°м •м—җм„ңлҠ” *к°„кҙҖ(и««е®ҳ)мқ„ м–»м—ҲлӢӨ.гҖҸн•ҳлӢӨ. лӮҙк°Җ мқјм°Қмқҙ кІҪм—°(經зӯө)м—җ мһ…мӢң(е…ҘдҫҚ)н•ҳм—¬ *лҢҖк°„(иҮәи««)кіј лҚ”л¶Ҳм–ҙ н•Ёк»ҳ н•ҳмҳҖлӢӨ. н•ңмһҗ(йҹ“еӯҗ)к°Җ мқҙм ңм—җ кі мҰқ(еҸӨиӯү)мқ„ лҒҢм–ҙ лӢ№мӢңмқҳ мһ¬мғҒ(е®°зӣё)мқҳ мқјмқ„ к·№лЎ (жҘөи«–)н•ҳм—¬ мЎ°кёҲлҸ„ көҪнһҳмқҙ м—Ҷм—ҲлӢӨ. кі§ к·ё л§җмқҖ к·ё л§ҲмқҢ мҶҚм—җ н’Ҳм—ҲлҚҳ л°”мһ„мқ„ м җм№ мҲҳ мһҲм—ҲлӢӨ. мқҙм—җ лҳҗ мқҙлҘј м•һм„ң м•Ңкі л§җн•ҳкё°лҘј, гҖҺк°„кҙҖмқ„ м–»лҠ”лӢӨлҠ” кІғмқҖ мӮ¬лһҢмқ„ м–»лҠ” кІғмқҙлӢҲ к·ё л§җмқҖ мһҗмӢ мқ„ мҶҚмқҙм§Җ м•ҠлҠ” кІғмқҙмҳӨ.гҖҸн•ҳлӢӨ. мқҙнӣ„м—җ лҢҖк°„мқҙ н•Ёк»ҳ л§җн•ң мқјмқҖ к·ё мқјмқҙ м„ңл„Ҳ м°ЁлЎҖк°Җ лҗҳм–ҙлҸ„ мғҒк°җмқҖ мқҙм—җ м •мӨ‘н•ҳмҳҖмңјлӮҳ кі§ лЁёлҰ¬лҘј лҒ„лҚ•м—¬ кёҚм •н•ҳм§ҖлҸ„ м•ҠмңјмӢңлӢӨк°Җ л§җн•ҳлҠ” мһҗл“Өмқҙ *ліөн•©(дјҸй–Ө)н•ҳм—¬ л– лӮҳм§Җ м•Ҡкё°лҘј лӘҮ лӢ¬мқҙ лҗҳл©ҙ мқҙм—җ н•ң мқјмқҙ мңӨн—Ҳ(е…ҒиЁұ)лҗҳлӢҲ мқҙк°ҷмқҙ н•ҳкё°лҘј л‘җ м„ё лІҲмқҙл©ҙ л§Ҳм№ЁлӮҙ лӘЁл‘җ к·ё л§җм—җ л”°лҘҙкІҢ лҗҳлӢҲ м„ұмғҒмқҙ к°„м–ё л°ӣм•„л“Өмһ„мқҳ лҸ„лҹүмқҙ 충мӢ мқҳ л§җмқ„ л”°м ё л°қнһҳм—җ л¶Җм§Җлҹ°н•ҳмӢ¬мқ„ м•Ңм•ҳмңјлӢҲ н•ңм”Ёмһҗк°Җ мӢӨлЎң мқјмЎ°(дёҖеҠ©)к°Җ лҗҳм—ҲлӢӨ. м–ҙм°Ң мўӢм•„н•ҳм§Җ м•ҠкІ лҠ”к°Җ! м•„! мЎ°м •м—җ н•ң м°©н•ң мӢ н•ҳк°Җ мһҲмңјл©ҙ мӮ¬л°©мқҙ к·ё мқҖлҚ•мқ„ л°ӣмңјлӢҲ н•ҳл¬јл©° м№ңнһҲ к·ё мІҳм§Җм—җ мһҲлҠ” мһҗм—җ мһҲм–ҙм„ңлҰ¬мҳӨ. 병진(1496)л…„ лҙ„м—җ н•ңмһҗ(йҹ“еӯҗ)лҠ” м •м–ё(жӯЈиЁҖ)мқ„ кұ°міҗ нҷ©н•ҙлҸ„ лҸ„мӮ¬(йғҪдәӢ)к°Җ лҗҳм–ҙ мҷём§Ғ(еӨ–иҒ·)мңјлЎң лӮҳк°”лӢӨ. к·ё м§Җл°©м—җ м „м—јлі‘мқҙ м„ұн•ҳкІҢ л§Ңм—°лҗҳм–ҙ л°ұм„ұмқҙ л§Һмқҙ мЈҪкІҢ лҗңм§Җк°Җ мӢңмқјмқҙ мҳӨлһҳ лҗҳм—ҲлӢӨ. м—ӯлҢҖ мһ„кёҲмқҳ л°ұм„ұ кё°лҘҙлҠ” м–ҙ진 лҚ•м—җ нһҳмһ…м–ҙ 비лЎқ мЎ°кёҲмқҖ мҲЁмқҖ лҸҢлҰ¬кІҢ лҗҳм—ҮмңјлӮҳ м—¬лҹ¬ нғҖлҸ„м—җ 비н•ҳл©ҙ м–ҙл Өмӣ лӢӨ. к·ёлҹ¬лҜҖлЎң л§үл¶Җ(幕еәң)м—җм„ң м •мӮ¬лҘј н–үн•Ём—җ м ҲмЎ°лҘј м§Җмјң кіҒм—җм„ң лҸ„мҡё мӮ¬лһҢмқҖ л°ҳл“ңмӢң к·ё м–ҙм§Ҡмқҙ нғҖлҸ„ к°җмӮ¬мҷҖ лҸ„мӮ¬л“Өм—җкІҢ мҡ°л‘җлЁёлҰ¬к°Җ лҗң м—°нӣ„м—җм•ј к·ё лӢӨмҠӨлҰјмқҳ нҡЁн—ҳмқҖ к°ҖнһҲ л°”лһ„ мҲҳ мһҲлӢӨ. л§Ҳм№ҳ м§ҖкёҲмқҳ нҷ©н•ҙлҸ„лҠ” кұ°мқҳ к·ёлҹ¬н•ҳм§Җ м•ҠмқҖк°Җ! к°җмӮ¬ мқҙкіөмқҖ м–ҙм§Ҳкі мң лҠҘн•Ёмқҙл©° мҶҢл¬ёлӮҳкі н•ңм”Ёмһҗк°Җ ліҙмўҢн•Ёмқҙ лҗҳм—ҲмңјлӢҲ н•ңм”ЁмһҗлҸ„ лҳҗн•ң м–ҙм§Ҳм—ҲлӢӨ. л‘җ м•„лҰ„лӢӨмӣҖмқҙ н•©н•ҳм—¬ к·ё кІ°кіјк°Җ мқҙлЈЁм–ҙм§җм—җлҠ” мқҳмӢ¬н• лӮҳмң„к°Җ м—ҶлӢӨ. нҷ©н•ҙлҸ„лЎң к°ҖлҠ” кёём—җлҠ” мҲҳмӢӯмЈјмқҳ кі мқ„мқҙ мһҲмңјлӢҲ н•ң м§Җ아비лӮҳ н•ң м§Җм–ҙлҜёк°Җ мһ„кёҲмқҳ нҳңнғқмқ„ мһ…м§Җ м•ҠмқҖ мһҗк°Җ мһҲкІ лҠ”к°Җ? кө¬мӨ‘к¶Ғк¶җ м•Ҳм—җм„ң мһ„кёҲк»ҳм„ң л„Ҳк·ёлҹ¬нһҲ м„ңмӘҪ(нҷ©н•ҙлҸ„)мқ„ лҸҢм•„ліҙкі к·јмӢ¬н•ҳмӢ¬мқҙлқј. к·ёлҹ°мҰү к·ё н–үмӢӨм—җ м–ҙм°Ң к°ҖнһҲ л§җмқҙ м—ҶкІ лҠ”к°Җ? мӮ¬н—Ңл¶Җ мӮ¬к°„мӣҗмқҳ м№ңкө¬лӮҳ н•ңлҰјмӣҗмқҳ м„ л№„л“Өмқҙ лӘЁл‘җ мҶЎлі„мқҳ мӢңк°Җ мһҲмңјлӢҲ лӘЁл‘җ м§Җм–ҙ мқҠмқ„ л§Ңн•ҳлӢӨ. кІён•ҳм—¬ м№ңн•ҳкі лҳҗ м„ңлЎң м•„лҠ” мқём—°мқҙ мһҲмңјлҜҖлЎң мқҙлҘј мң„н•ҳм—¬ м„ң(еәҸ)лҘј м“ҙлӢӨ.
л¬ём„ңкө¬л¶„ : н•ңкөӯ문집мҙқк°„
м„ң лӘ… : н—Ҳл°ұм •м§‘(иҷӣзҷҪдәӯйӣҶ)
к¶Ң м°Ё лӘ… : иҷӣзҷҪдәӯж–ҮйӣҶеҚ·д№ӢдәҢ
л¬ё мІҙ лӘ… : еәҸ
кё° мӮ¬ лӘ… : йҖҒй»ғжө·йғҪдәӢйҹ“иЁ“и©©еәҸ
м Җ/нҺё/н•„мһҗ : нҷҚк·ҖлӢ¬(жҙӘиІҙйҒ”)мЎ°м„ (жңқй®®) мӢңлҢҖ(жҷӮд»Ј) 10лҢҖ м—°мӮ°мЈј(зҮ•еұұдё») л•Ңмқҳ л¬ёмӢ (ж–ҮиҮЈ). мһҗлҠ” кІём„ (е…је–„), нҳёлҠ” н—Ҳл°ұлӢ№(иҷӣзҷҪе Ӯ)н•Ён—Ҳм •(ж¶өиҷӣдәӯ). ліёмқҖ л¶Җкі„(зј¶жәӘ). лІјмҠ¬мқҙ лҢҖм ңн•ҷ(еӨ§жҸҗеӯё)м—җ мқҙлҰ„. м—°мӮ°мЈј(зҮ•еұұдё») 4(1598)л…„ л¬ҙмҳӨмӮ¬нҷ” л•Ң мҷ•мқҳ мӢӨмұ…мқ„ к°„(и««)н•ҳлӢӨк°Җ мўҢмІңлҗЁ. к°‘мһҗмӮ¬нҷ” л•Ң лӘЁн•Ё(и¬Җйҷ·)мқ„ л°ӣм•„ мЈҪмқҢ. мӢңнҳё(и«Ўиҷҹ)лҠ” л¬ёкҙ‘(ж–ҮеҢЎ). м Җм„ң(и‘—жӣё)гҖҺн—Ҳл°ұм •л¬ём§‘(иҷӣзҷҪдәӯж–ҮйӣҶ)гҖҸ л“ұ. (1438 ~1504)
кІҪм •м„ мғқ집(敬дәӯе…Ҳз”ҹйӣҶ) к¶Ңм§Җ 4(и©©)
нңҙлҘҳ(鵂鶹 : мҲҳлҰ¬ л¶Җм—үмқҙ)
лӮ®м—җлҠ” нғңмӮ°к°ҷмқҙ нҒ° кІғлҸ„ ліҙм§Җ лӘ»н•ҳлӮҳ, л°Өмқҙл©ҙ лІјлЈ©мқҙлӮҳ мқҙлҸ„ лҠҘнһҲ мӮҙн”јл„Ө. к°Җмқҳ(иіҲиӘј)мқҳ ліөмЎ°(йө¬йіҘ)мҷҖ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ҳ м—¬мҡ°лҠ”, л‘җ мқҙлҰ„мқҙлӮҳ ліёлһҳ н•ңк°Җм§Җ мқјмқҙлӢҲ. мқҙлҘј мҸҳм•„ нқүн•ҳкі мҡ”л§қн•Ёмқ„ мЈҪмқј кІғмқҙлӮҳ, м җміҗм„ң мҳҲм–ёмқҳ л§җлЎң кІ°м •н•ҳмҳҖл„Ө. л§Ңм•Ҫ к°Ғк°Ғ мқјмқ„ м•”мӢңн•ҳм—¬ л¶Җм№Ёмқҙ м•„лӢҲлқјл©ҙ, л‘җк°Җм§Җ лӘЁл‘җ нҶөн•ҙ мЈјм§Җ м•Ҡм•ҳмңјлҰ¬. н•ҙм§Ҳл…ҳм—җ н–Үл№ӣмқҖ н–Үл№ӣ 비лӮҢкіј лӢӨлҘҙкі , м—¬кҙҖмқҖ мҡ°лҰ¬м§‘мқҙ м•„лӢҲл„Ө. мҪ”кі лҠ” мҶҢлҰ¬ мҡ°л Ҳк°ҷмқҙ мҡёл ӨлҸ„, нҷ”мҷҖ ліөм—җлҠ” мғҒкҙҖ м—Ҷл„Ө.
еҚҒдә”. мІңм§Җмқёл¬ё(еӨ©ең°дәәж–Ү):мІңкіјм§ҖмҷҖмқёмқҳ л¬ё(ж–Ү)
мҷ•к»ҳм„ң мқҙл ҮкІҢ л§җм”Җн•ҳм…ЁлӢӨ. гҖҺмІң(еӨ©)мқҳ *л¬ё(ж–Ү)мқҙ мһҲкі м§Җ(ең°)мқҳ л¬ё(ж–Ү)мқҳ мһҲкі мқё(дәә)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мһҲмңјлӢҲ, мқёл¬ё(дәәж–Ү)кіј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лӢӨлҘёк°Җ? 2)кІ°мҠ№(зөҗ繩)мқҳ мӢңлҢҖмқҳ м „м—җлҸ„ лҳҗн•ң л¬ё(ж–Ү)мқҙ мһҲм—ҲлҚҳк°Җ? *н•ҳлҸ„лқҪм„ң(жІіең–)мқҳ л¬ё(ж–Ү)лҸ„ мІңм§Җмқёмқҳ л¬ёмқҙлқј л§җн• мҲҳ мһҲлҠ”к°Җ? *лӢ№мҡ°(е”җиҷһ) *мӮјлҢҖ(дёүд»Ј)мқҳ л•Ңм—җлҸ„ кө°мӢ (еҗӣиҮЈ)к°„мқҳ л¶Ҳм°¬м„ұмқҳ л§җкіј мӮ¬м ңмқҳ л¬ёлӢөмқҳ л§җкіј кұ°лҰ¬мҷҖ кіЁлӘ©мқҳ мғҒмҠӨлҹҪкұ°лӮҳ мҙҢмҠӨлҹ¬мҡҙ л§җлҸ„ лӘЁл‘җ кІҪм Ғ(經зұҚ)м—җ мһҲм–ҙ л¬ё(ж–Ү)мқҙ лҗҳм–ҙ нӣ„м„ём—җ *мҲңкІҪ(иҚҖеҚҝ)․*л¬өм Ғ(еўЁзҝҹ)․*м–‘мЈј(жҘҠжңұ)․*мҷ•мҲҳмқё(зҺӢе®Ҳд»Ғ)мқҖ лӘЁл‘җ лң»мқ„ л¬ё(ж–Ү)м—җ л‘җм—ҲмңјлӮҳ мңЎкІҪ(六經)кіј лҚ”л¶Ҳм–ҙ 비함мқ„ м–»м§Җ лӘ»н•ҳлӢҲ м•„мҡёлҹ¬ л¬ҙм—Ү л•Ңл¬ёмқёк°Җ? л¬ёмһҘ(ж–Үз« )мқҙлһҖ м„ёмғҒкіј лҚ”л¶Ҳм–ҙ мҳӨлҘҙлӮҙлҰ¬лӢҲ мҶЎмӣҗ(е®Ӣе…ғ)мқҖ н•ңлӢ№(жјўе”җ)м—җ лҜём№ҳм§Җ лӘ»н•ҳкі н•ңлӢ№(жјўе”җ)мқҙ мӮјлҢҖ(дёүд»Ј)м—җ лҜём№ҳм§Җ лӘ»н•ң к№ҢлӢӯмқҖ л¬ҙм—Үмқёк°Җ? *н•ңмһҗ(йҹ“еӯҗ)мқҳ л¬ё(ж–Ү)мқҖ 8лҢҖмқҳ мҮ нҮҙн•Ёмқ„ мқјмңјнӮӨкі , *кө¬м–‘мҲҳ(жӯҗйҷҪи„©)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мқёмқҳлЎҖм•…(д»Ғзҫ©пҰ¶жЁӮ)мқҳ м„Ө(иӘӘ)мқ„ л“Өм–ҙ лӮҙм—ҲмңјлӮҳ нӣ„м„ё мӮ¬лһҢл“ӨмқҖ кіјм—° лӘЁл‘җ кі л¬ё(еҸӨж–Ү)мқ„ лҠҘнһҲ н•ҳм§Җ лӘ»н•ҳмҳҖлҚҳк°Җ? м—јкі„(жҝӮжәӘ)мқҳ мЈјлҸҲмқҙ(е‘Ёж•Ұ頤), лӮҷм–‘(пӨ•йҷҪ)мқҳ м •нҳё(зЁӢйЎҘ)․м •мқҙ(зЁӢ頤), кҙҖмӨ‘(й—ңдёӯ)мқҳ мһҘмһ¬(ејөијү), лҜјмӨ‘(閩дёӯ)мқҳ мЈјнқ¬(жңұзҶ№) л“ұ м—¬лҹ¬ кө°мһҗ(еҗӣеӯҗ)л“Өмқҳ л°ңм–ё(зҷјиЁҖ)н•Ёмқҙ мңЎкІҪ(六經)м—җ м•ҲнҢҺмңјлЎң л¬ё(ж–Ү)мқҙ лҗЁмқҙ м–ҙм°Ң л°°мҡҙ л°” лҗҳм—ҲлҚҳк°Җ? м „мҲ (еүҚиҝ°)н•ң л°”мқҳ кёҖмқҖ лҳҗн•ң к°ҖнһҲ л“ӨмқҢмқҙ мһҗмғҒн•ңк°Җ? к·ёлҢҖ лҢҖл¶ҖлҠ” мқҙлҘј к°•(и¬ӣ)н•ҳм—¬ мқөнһҲ м•Ңкі мһҲлӢӨ. к·ёкІғмқ„ к°Ғк°Ғ лӢӨ нҺём Җ(зҜҮи‘—)н•ҳлқјгҖҸн•ҳмӢңлӢӨ. нҷҚм№ҳ(ејҳжІ») к°‘мқё(1494) лі„мӢң(еҲҘи©Ұ)м—җ м ң1мқёмңјлЎң кёүм ңн•ң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 мӢ мқҖ лҢҖн•ҳм—¬ мӮјк°Җ мғқк°Ғн•ҳмҳӨлӢҲ мЈјмғҒм „н•ҳк»ҳмҳөм„ңлҠ” мҙқлӘ…(иҒ°жҳҺ)н•ҳкі мҳҲм§Җ(зқҝжҷә)мқҳ мһҗм§Ҳ(иіҮиіӘ)лЎң мЎ°мў…(зҘ–е®—)мқ„ мқҙм–ҙ л“ л“ н•ң көӯкё°(еңӢеҹә)лҘј мң кө¬(ж”ёд№…)н•ң м„ёмғҒм—җ м„ёмҡ°л Өкі , мҳӨнһҲл Ө лң»мқ„ мһғмқҖ л“Ҝн•ҳмӢңкі мҠӨмҠӨлЎң м„ұмқё лҗҳм§Җ м•ҠмқҖ л“Ҝ н•ҳмӢңлӢҲ л“ңл””м–ҙ лӮҳм•„к°Җ мӢ л“ұмқҖ м–ҙм „(еҫЎеүҚ)м—җм„ң мІ«м§ёлЎң мІңм§Җмқё(еӨ©ең°дәә)мқҳ л¬ё(ж–Ү)мқ„ л“Өм–ҙм„ң м—ӯлҢҖ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м „н•ҳ(ж®ҝдёӢ)к»ҳм„ң (йҒ“)лҘј л°”лқјліҙкі лҸ„ м•„м§Ғ ліҙм§Җ лӘ»н•ң л“Ҝ м„ұн•ң л§ҲмқҢмқ„ ліҙмқҙкі мһҲмҠөлӢҲлӢӨ. мӢ мқҖ 비лЎқ мҡ°л§Ө(ж„ҡжҳ§) н•ҳмҳӨлӮҳ к°җнһҲ м •л°ұ(зІҫзҷҪ)н•ҳм§Җ лӘ»н•ң н•ң л§ҲмқҢмңјлЎң мғҒк°җк»ҳм„ң л¬јмңјмӢ¬мқҳ л§Ң분мқҳ мқјмқҙлқјлҸ„ л¶Җмқ‘(еүҜжҮү)н•ҳм—¬ лң»мқ„ мІңн•ҳм—җ нҺҙл ӨлҠ” кІғмңјлЎң мӢ мқҖ м—Һл“ңл Ө 3)м„ұмұ…(иҒ–зӯ–)мқ„ мқҪкі л§җн•ҳкё°лҘј, мӢ мқҖ мғқк°Ғн•ҳмҳөкё°м—җ н•ҳлҠҳмқ„ ліҙл©ҙ мһҗм—°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мһҲмңјлҜҖлЎң мқјмӣ”(ж—ҘжңҲ)мқҙ *мЎ°лҰј(з…§иҮЁ)н•ҳлӢҲ лі„л“Өмқҙ мқҙм—җ м°¬м—°нһҲ лІҢмқҙкі л•…мқҙ мһҗм—°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мһҲмңјлҜҖлЎң мӮ°мІң(еұұе·қ)мқҳ нқҗлҰ„кіј мһ¬(еіҷ)к°Җ мқҙм—җ мһҲмҠөлӢҲлӢӨ. мҙҲлӘ©мқҙ мқҙм—җ мӮҙкі мһҗлһҚлӢҲлӢӨ. мӮ¬лһҢмқҙ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кё°мҡҙмқ„ л°ӣм•„ *м–‘мқҳ(пҘёе„Җ)мқҳ мӮ¬мқҙм—җм„ң мӮ° мҰү к·ё лҸ„лҚ•кіј мқёмқҳ(д»Ғзҫ©)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к°ҖмҡҙлҚ°м—җм„ң мӢӨ(еҜҰ)н•ЁмқҖ к·ёлһҳм„ңмһ…лӢҲлӢӨ. мҳҲм•…(пҰ¶жЁӮ) л¬ёмһҘ(ж–Үз« )мқҳ л¬ё(ж–Ү)мқҖ л°–м—җ лӮҳнғҖлӮЁмқҙлӢҲ к·ёлһҳм„ңмһ…лӢҲлӢӨ. к·ё л¬ё(ж–Ү)мқ„ л§җн•ң мҰү 비лЎқ к°Ғк°Ғ к°ҷм§Җ м•ҠмңјлӮҳ к·ё мқҙм№ҳлҘј л§җн•ң мҰү мқјм°Қмқҙ лӢӨлҰ„мқҙ мһҲм§Җ м•„лӢҲн•ҳлӮҳ м–ҙм°Ң кІ°мҠ№(зөҗ繩)мқҳ мӢңлҢҖ м•һ мӮ¬лһҢмқҖ л¬ё(ж–Ү)мқҙ м•„л§Ҳ нҺҙм§Җ лӘ»н•ҳмҳҖмқ„ кІғмқҙкі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мқҙлҜё н•ҳлҸ„(жІіең–)к°Җ лӮҳмҳЁ л’ӨлҠ” мқҙлҜё лӮҳнғҖлӮ¬мңјлӢҲ мқёл¬ё(дәәж–Ү)мқҙ мқҙлҜё лӮҳнғҖлӮҳ *мӮјмһ¬(дёүжүҚ)мқҳ лҸ„(йҒ“)к°Җ 비лЎңмҶҢ 갖추м–ҙмЎҢмҠөлӢҲлӢӨ. к·ёлҹ¬н•ң нӣ„м—җ ліөнқ¬(ліөзҫІ)м”Ёмқҳ нҢ”мҫҢ(е…«еҚҰ)мқҳ к·ёлҰјмқҙ лӮҳмҳӨкі л¬ё(ж–Ү)мқҳ лҸ„(йҒ“)к°Җ мқҙм—җм„ң мқјм–ҙлӮ¬мҠөлӢҲлӢӨ. мқҙлҠ” кі§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л¬ё(ж–Ү)мқҙлҜҖлЎң кі§ мқё(дәә)мқҳ л¬ё(ж–Ү)мһ…лӢҲлӢӨ. лҢҖмҡ°(еӨ§зҰ№)лҠ” *кө¬мЈј(д№қз–Ү)лҘј лІҢмқҙкі л¬ё(ж–Ү)мқҳ мқҙ(п§Ө)к°Җ м°¬м—°(зҮҰ然)н•ҳлӢҲ мқҙлҠ” кі§ мқёмқҳ л¬ё(ж–Ү)мқҙл©° кі§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л¬ё(ж–Ү)мһ…лӢҲлӢӨ. мқҙлҠ” к·ёлҹ¬лҜҖлЎң мҳӨм§Ғ м„ұмқё(иҒ–дәә)л§Ңмқҙ лҠҘнһҲ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л¬ё(ж–Ү)мқ„ мІҙл“қ(й«”еҫ—)н•ҳкі мқҙлҘј л§ҲмқҢм—җ лӢҙм•„ лҸ„лҚ•мқҙ лҗҳм–ҙ мқҙлҘј л°ң(зҷј)н•ҳм—¬ л¬ёмӮ¬(ж–Үи©һ)к°Җ лҗ©лӢҲлӢӨ. лҢҖк°ң м„ұм •(жҖ§жғ…)мқ„ мқҠмқҖ 311нҺёмқҳ мӢңк°Җ мһҲмңјлӮҳ м •лІҢ(еҫҒдјҗ : лӘҪкі лі‘мқҳ м№Ёмһ…мқ„ м •лІҢн•Ё) н•ң мқјмқҙ мһҲмқҖ м§Җ 242л…„мқҳ м„ёмӣ”мқҙ нқҳлҹ¬ мқҙ лҳҗн•ң к·ё мһҗм—°(иҮӘ然)мқҳ л¬ё(ж–Ү)мңјлЎң мқён•ҳм—¬ к·ё *мҳЁм¶•(иҳҠи“„)лҗң л°”мқҳ кІ°мӢӨ(зөҗеҜҰ)мқҙ лӮҳнғҖлӮң мҰү м „н•ҳ(ж®ҝдёӢ)к»ҳм„ңлҠ” мқҙлҜё мӢ 충(е®ёиЎ· : мһ„кёҲмқҳ лң»)м—җ мқҙлҘј к°•(и¬ӣ)н•ң ліёл°”нғ•мһ…лӢҲлӢӨ. мӢ мқҖ м–ҙм°Ң к°җнһҲ к·ё мӮ¬мқҙм—җ л§қл…•лҗң мқҳл…јмқ„ н•ҳкІ мҠөлӢҲк№Ң? мӮјк°Җ м—Һл“ңл Ө мғҒк°җмқҳ лҢҖмұ…(е°Қзӯ–)мқ„ мқҪм–ҙ л§җн•©лӢҲлӢӨ. мӢ мқҖ мқјм°Қмқҙ *м „лӘЁ(е…ёи¬Ё)лҘј ліҙм•„ мӢӨл Ө мһҲлҠ” л°”к°Җ лӘЁл‘җ *мҡ°л¶Ҳм§Җм–ё(吁咈д№ӢиЁҖ)мңјлЎң к№Ёмҡ°міҗ л“ңлҰ¬кі , *м„ңлӘ…(иӘ“е‘Ҫ)мқҳ кё°лЎқн•ң л°”лҠ” кІҪкі„н•Ёмқ„ кі н•ҳкі , нһҳм”Җмқ„ к¶Ңн•ҳлҠ” мӮ¬м„Ө(иҫӯиӘӘ)мқҖ мғҒн•ҳ(дёҠдёӢ)мқҳ мӮ¬мқҙк°Җ м •мқҙ нҶөн•ҳкі кө°мӢ (еҗӣиҮЈ)мқҳ мӮ¬мқҙлҠ” лң»мқҙ мғҒлӢ¬н•ҳм§Җ м•„лӢҲн•Ёмқҙ м—Ҷкі л¬ё(ж–Ү)м—җ лң» мһҲмқҢмқ„ кө¬н•ҳм§Җ м•„лӢҲн•ҳкі лҸ„лҚ•(йҒ“еҫ·)мқ„ лӘём—җ м–»мқҖ мһҗлҠ” мһҗм—°нһҲ л°–м—җ лӮҳнғҖлӮҳ ліҙмқҙлӢҲ м–ҙл Өмҡҙ л¬ёлӢө(е•Ҹзӯ”)мқ„ мқҳмӢ¬(з–‘еҝғ)н•Ём—җ мқҙлҘҙкі , 20нҺёмқҳ л…јм–ҙ(пҘҒиӘһ)м—җ 4)мЈјм—ӯ(зҙ¬з№№) ліҖм„Ө(еҚһиӘӘ)н•Ёмқҙ кё°мҲ лҗҳкі 7нҺёмқҳ мқёмқҳ(д»Ғзҫ©)лҘј лӘ…л°ұнһҲн•ҳм—¬ лҢҖн•ҷ(еӨ§еӯё)м—җ м „(еӮі)н•ҳкі *мҲҳкё°м№ҳмқём§ҖлҸ„(дҝ®е·ұжІ»дәәд№ӢйҒ“)к°Җ л°қм•„ мӨ‘мҡ©(дёӯеәё)мқ„ м§Җм–ҙм„ң *м„ұлӘ… лҸ„лҚ•(жҖ§е‘ҪйҒ“еҫ·)мқҳ мқҙм№ҳк°Җ л“Өм–ҙлӮҳлӢҲ мқҙлҠ” мӮ¬м ң(её«ејҹ)мқҳ мӮ¬мқҙ лҝҗл§Ңм•„лӢҲлқј мқҙ л¬ё(ж–Ү)мқҳ 진мӢӨ(зңһеҜҰ)мқ„ *к°•лӘ…(и¬ӣжҳҺ)н• л”°лҰ„мһ…лӢҲлӢӨ. лҸҢм•„мҳЁ м„ёмғҒмқҳ н•ҷл¬ёмқ„ *мЎ°мң (и©”и«ӯ)н• лҝҗмһ…лӢҲлӢӨ. мӢңмқё(и©©дәә)м—җкІҢ мқҙлҘҙлҹ¬м„ңлҠ” мқҠмқҖ л°”мқҳ мһ¬лЈҢк°Җ кұ°лҰ¬мқҳ 비루н•ң *м•јк°қ(йҮҺе®ў)мқҳ мӮ¬мһҘ(и©һз« : мӢңк°ҖмҷҖ л¬ёмһҘ)мқҙмҡ”. л¶ҖмқёмқҙлӮҳ м—¬мһҗмқҳ мӮ¬мқҙм—җм„ң л§Һмқҙ лӮҳмҳӨкі нӣ„м„ё(еҫҢдё–)мқҳ мӮ¬лһҢ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лҜём№ҳм§Җ лӘ»н•ЁмқҖ л•Ңк°Җ к·ёл ҮкІҢ н•Ёмһ…лӢҲлӢӨ. *лӮңлҰү(пӨҹйҷө)мқҳ н•ҷ(еӯё)к°ҷмқҢм—җ мқҙлҘҙлҹ¬м„ңлҠ” 비лЎқ мҷ•лҸ„лҘј лҶ’мқҙкі л°ұкіө(дјҜеҠҹ)м—җкІҢ көҙ(еұҲ)н•ҳкі мқёмқҳ(д»Ғзҫ©)лҘј к·ҖнһҲ м—¬кё°кі кіөлҰ¬(еҠҹеҲ©)лҘј мІң(иіӨ)нһҲ м—¬кІјлӢӨ н• м§ҖлқјлҸ„ к·ёмқҳ мӢӨ(еӨұ)мқё мҰү м„ұм•…м§Җ м„Ө(жҖ§жғЎд№ӢиӘӘ)мқҙм—ҲмҠөлӢҲлӢӨ. к°•лҸ„(жұҹйғҪ)мқҳ лҢҖмұ…мқҖ кі§ к·ё л§Ҳл•…н•Ёмқҙ л°”лҰ„м—җ мһҲкі к·ё мқҙлЎңмӣҖмқ„ кҫҖн•ҳм§Җ м•Ҡкі к·ё лҸ„(йҒ“)лҘј л°қнһҲкі к·ё кіө(еҠҹ)мқ„ н—Өм•„лҰ¬м§Җ м•Ҡм•ҳмңјлӮҳ к·ё мӢӨ(еӨұ)мқҖ кі§ мһ¬мқҙ(зҒҪз•°)мқҳ м„Ө(иӘӘ)м—җ нқҳл ҖмҠөлӢҲлӢӨ. *м–‘мӣ…(жҘҠйӣ„)мқҙ м—ӯкІҪ(жҳ“經)мқ„ ліёл°ӣм•„м„ң *нғңнҳ„(еӨӘзҺ„)мқ„ м§Җм—ҲмңјлӮҳ мӢқмһҗ(иӯҳиҖ…)л“ӨмқҖ к·ё мІңк·ј(ж·әиҝ‘)н•Ёмқ„ м•Ңм•ҳмҠөлӢҲлӢӨ. *мҷ•нҶө(зҺӢйҖҡ)мқҖ 비лЎқ м Җм„ң мӨ‘мқҳ м„Ө(иӘӘ)н•Ёмқҙ л…јм–ҙ(пҘҒиӘһ)лҘј ліёл–імңјлӮҳ нӣ„м„ё(еҫҢдё–)м—җ к·ё *м°ём Ҳ(еғӯз«Ҡ)н•ЁмқҖ м•Ңм•ҳмңјлӢҲ лӘЁл‘җ лӢӨ лң»мқ„ л¬ё(ж–Ү)м—җ л‘җм—ҲмңјлӮҳ лӘём—җ мһҲлҠ” кІғмқҖ мӢӨлӢөм§Җ лӘ»н•ЁмңјлЎң л¬ё(ж–Ү)м—җ л°ң(зҷј)н•ң кІғмқҖ мқҙмІҳлҹј л…ёл‘”(пӨ№йҲҚ)н•ҳлӢҲ м–ҙм°Ң мЎұнһҲ мңЎкІҪ(六經)кіј лҚ”л¶Ҳм–ҙ лҚ”мҡұ лӮҳлһҖн• мҲҳ мһҲмҠөлӢҲк№Ң? мқҙлҠ” кі§ м „н•ҳк°Җ мқҙлҜё л§ҲмқҢ мҶҚм—җ мқҙлҘј нҢҗлі„(еҲӨеҲҘ)н•ҳм—¬ мғҒм„ён•ҳкі л¶„лӘ…н• кІғмһ…лӢҲлӢӨ. мӢ мқҙ м–ҙм°Ң к°җнһҲ к·ё мӮ¬мқҙм—җ кө°мҶҢлҰ¬лҘј лҒјмҡ°кІ мҠөлӢҲк№Ң? м—Һл“ңл Ө *м„ұмұ…(иҒ–зӯ–)мқ„ мқҪкі л§җн•ҳмҳӨлӢҲ ������мӢ мқҙ мғқк°Ғн•ҳмҳөкё°м—җ л¬ёмһҘ(ж–Үз« )мқҳ м„ұмҮ (зӣӣиЎ°)лҠ” м„ёмғҒмқҳ 5)мҠ№к°•(еҚҮйҷҚ)м—җ л”°лҘҙлӢҲ лҢҖк°ң мҶЎмӣҗ(е®Ӣе…ғ)мқҳ л¬ё(ж–Ү)мқҖ н•ңлӢ№(жјўе”җ)мқҳ *м§ҲмӢӨ(иіӘеҜҰ)м—җ лҜём№ҳм§Җ лӘ»н•ҳкі , н•ңлӢ№мқҳ л¬ёмқҖ лҳҗ мӮјлҢҖ(дёүд»Ј)м—җ лҜём№ҳм§Җ лӘ»н•ң кІғмқҖ лҸ„лҚ•мқ„ лӘём—җ мұ„мӣҖмқҙ лӢӨн•ҳм§Җ лӘ»н•Ём—җ мһҲмңјлҜҖлЎң л¬ёмһҘмқ„ л°–м—җ л°ң(зҷј)н•ЁмқҖ лҳҗн•ң л°”лЎңмһЎкё° м–ҙл өмҠөлӢҲлӢӨ. н•ҳл¬јл©° нӣ„м„ёмқҳ мӮ¬лһҢмқҙ лӘЁл‘җ л¬ё(ж–Ү )м—җл§Ң л§ҲмқҢмқ„ м“°кі л¬ё(ж–Ү)мқҳ 진мӢӨн•Ёмқ„ кө¬н•ҳм§Җ м•ҠмңјлҜҖлЎң *м•Ңл¬ҳ(揠иӢ—)мқҳ к·јмӢ¬мқҙ мһҲмҠөлӢҲлӢӨ. лӘЁл‘җ мқё(д»Ғ)м—җ лң»мқ„ мғҲкІЁм„ң мқҙм№ҳ(п§ӨиҮҙ)мқҳ мҲңмҲҳн•Ём—җ к·јліёмқ„ мӮјм§Җ м•„лӢҲн•ЁмңјлЎң *мҡ•мҶҚл¶ҖлӢ¬(ж¬ІйҖҹпҘ§йҒ”)мқҳ нҸҗлӢЁмқҙ мһҲмҠөлӢҲлӢӨ. нҷҖлЎң *м°Ҫл Ө(жҳҢй»Һ)мқҳ л¬ё(ж–Ү)мқҖ мҡ©(龍)мқҙ лӮҳлҠ” л“Ҝ, лҙүнҷ©(йііеҮ°)мқҙ лӣ°лҠ” л“Ҝ, н•ҙк°Җ л№ӣлӮҳлҠ” л“Ҝ, мҳҘмқҙ к№ЁлҒ—н•ң л“Ҝ, мҲңмҲҳн•ҳм—¬ н•ңкІ°к°ҷмқҙ м •(жӯЈ)м—җм„ң лӮҳмҳҙмңјлЎң *мӣҗлҸ„(еҺҹйҒ“) мқјнҺё(дёҖзҜҮ)мңјлЎң *лӘ…көҗ(еҗҚж•Һ)лҘј л¶Җм§Җ(жү¶жҢҒ)н•ҳкі , *л¶ҲкіЁ(дҪӣйӘЁ)мқ„ л°°мІҷн•ҳлҠ” н‘ң(иЎЁ)лҘј лӢӨмӢң мҳ¬л Ө мқҙлӢЁ(з•°з«Ҝ)мқ„ л¬јлҰ¬міҗ л°”лҘҙкІҢ н•Ёмқҙ мһ„кёҲмқҙ лӮҙлҰ¬мӢ лҢҖмұ…(е°Қзӯ–)м—җ мқҙлҘёл°” л¬ё(ж–Ү)мқ„ мқҙлҘҙмј°лӢӨн•ҳлӮҳ *8лҢҖк°Җ мҮ нҮҙ(иЎ°йҖҖ)н•ң кІғмқҖ мқҙкІғмһ…лӢҲлӢӨ. *кө¬м–‘кіө(жӯҗйҷҪе…¬)мқҳ л¬ё(ж–Ү)к°ҷмқҖ мҰү м°Ҫл Ө(жҳҢй»Һ)мқҳ к·јм—„(謹еҡҙ)мқ„ ліёл°ӣкі кіөмһҗмҷҖ 맹мһҗмқҳ к°„кІ°(з°ЎжҪ”)н•ҳкі *кі м•„(еҸӨйӣ…)н•Ёмқ„ мқөнһҲм–ҙ, мҲң(иҲң) мһ„кёҲмқҳ лң°м—җ лҶҖм•„ *мҶҢмҶҢ(з°«йҹ¶)мқҳ мқҢм•…мқ„ л“ӨмқҖ л“Ҝн•ҳм—¬ мқҪкё° к№ҢлӢӨлЎңмҡҙ кө¬м Ҳ(еҸҘзҜҖ)мқҙ ліҖн•ҳм—¬ нҳјнӣ„(жёҫеҺҡ)н•ҙ м§Җкі *н—ҳкҙҙ(йҡӘжҖӘ)н•ң *мӮ¬мһҘ(иҫӯз« )мқҙ л°”лҖҢм–ҙ нҸүмқҙн•ҙм§ҖлӢҲ л°”лЎң мғҒк°җмқҳ мұ…л¬ё(зӯ–ж–Ү)кіј к°ҷм•„ мқҙлҘёл°” мқёмқҳ(д»Ғзҫ©)мҷҖ мҳҲм•…(пҰ¶жЁӮ)мқҳ м„Ө(иӘӘ)н•Ёмқҙ мқҙкІғмһ…лӢҲлӢӨ. 비лЎқ к·ёлҹ¬лӮҳ к·ё мӮјлҢҖ(дёүд»Ј) мқҙн•ҳмқҳ л¬ё(ж–Ү)мқ„ лҜёлЈЁм–ҙ ліё мҰү мқҙ *мҲҳмһҗ(ж•ёеӯҗ)лҠ” 비лЎқ мЎұнһҲ лӘ»н•ҳм§Җ м•ҠмңјлӮҳ мқҙлҘј мӮјлҢҖ(дёүд»Ј) мқҙмғҒмқҳ л¬ё(ж–Ү)м—җм„ң кө¬н•ң мҰү мқҙ мҲҳмһҗ(ж•ёеӯҗ)мқҳ л¬ё(ж–Ү)мқ„ кіјм—° м„ұкІҪ(иҒ–經)м—җ н•©лӢ№(еҗҲ當)н•ңк°Җ н•©лӢҲлӢӨ. мқҙлҠ” кі§ м „н•ҳк°Җ мқҙлҜё л§ҲмқҢм—җ мқөнһҲ мғқк°Ғн•Ёмқҙлқј мӢ мқҙ м–ҙм°Ң к°җнһҲ к·ё л¬јмқҢм—җ *м–өм„Ө(иҮҶиӘӘ)н•ҳмҳӨлҰ¬к№Ң? мӢ мқҙ м—Һл“ңлҰ¬м–ҙ м„ұмғҒмқҳ 7)мұ…л¬ё(зӯ–ж–Ү)мқ„ мқҪкі л§җн•ҳкё°лҘј, мӢ мқҖ к·ёмңҪнһҲ мқҙлҘҙкё°лҘј, мЈјкіө(е‘Ёе…¬)мқҙ мЈҪмһҗ м„ұмқёмқҳ лҸ„к°Җ н–үн•ҙм§Җм§Җ м•„лӢҲн•ҳл©°, 맹мһҗ(еӯҹеӯҗ)к°Җ мЈҪмһҗ м„ұмқёмқҳ н•ҷл¬ёмқҙ л°қм§Җ лӘ»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л¬ё(ж–Ү)мқҖ мІңлҸ„(еӨ©йҒ“)лҘј кө¬н•ҳм§Җ м•Ҡкі лҸ„ л•…м—җ л–Ём–ҙм§Җм§ҖлҠ” м•„лӢҲн•ҳмҳҖмңјлӢҲ мҶЎмЎ°(е®Ӣжңқ)мқҳ *м—јкі„(жҝӮжәӘ)м—җ мқҙлҘҙлҹ¬ к·ё к·јмӣҗмқ„ *мӨҖм„Ө(жөҡжё«)н•ҳл“Ҝмқҙ к№ЁлҒ—мқҙ н•ҳкі , *мқҙлқҪ(дјҠжҙӣ)мқҖ к·ё нқҗлҰ„мқ„ мқёлҸ„н•ҳм—¬ *кҙҖлҜј(й—ң閩)мқҳ л№ӣмқҙ лӮЁмқ„ лҸ„мҷ”мҠөлӢҲлӢӨ. *кІҪм„ұ(жҷҜжҳҹ)мқҙлӮҳ лҙүнҷ©(йііеҮ°)мқҖ мІңн•ҳмқҳ мҫҢ(еҝ«)н•Ёмқҙ *нғңмӮ°л¶ҒлҸ„(жі°еұұеҢ—ж–—)мқё н•ҷмһҗлҘј ліҙкі к·ё л§җмқҳ мқёмқҳ(д»Ғзҫ©)м—җ мқҳн•ҳм—¬ лҸҢм•„мҳЁ мҰү *нҶөм„ң(йҖҡжӣё)мқҳ мҲҳнҺё(ж•ёзҜҮ)мқҳ л…јм§Җ(пҘҒж—Ё)м—җ лӮҳнғҖлӮҳкі мқҢм–‘мқё мҰү нғңк·№(еӨӘжҘө)мқҳ мқјлҸ„(дёҖең–)м—җ ліҙмқҙлӢҲ мқҙлҠ” м—јкі„(жҝӮжәӘ)к°Җ м—ӯ(жҳ“)м—җ к·јліёмқ„ л‘җм–ҙ к·ёлҹ¬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м„ұкІҪ(иӘ 敬)мңјлЎңмҚЁ лҚ•(еҫ·)м—җ л“Өм–ҙк°ҖлҠ” л¬ёмқҙ лҗЁмңјлЎң *мҳҘлЈЁ(еұӢжјҸ)мқҳ нҷҖлЎң мһҲлҠ” кіім—җм„ңлҸ„ к·јмӢ н•ЁмңјлЎңмҚЁ, мқҙлҠ” мқҙлқҪ(дјҠжҙӣ)мқҳ н•ҷл¬ёмқҙ мӨ‘мҡ©(дёӯеәё)м—җ к·јліёмқ„ л‘” кІғмқҙлӢҲ к·ёлһҳм„ңмһ…лӢҲлӢӨ. мҷ„кі (й ‘еӣә)н•Ёмқ„ л°”лЎң мһЎкі м–ҙлҰ¬м„қмқҢмқ„ кІҪкі„н•ҳм—¬ м•„м„ұ(дәһиҒ– : 맹мһҗ)мқҳ м„ұм„ (жҖ§е–„)мқҳ м„Өкіј м–‘кё°(йӨҠж°Ј)мқҳ л…јмқҙ мһҲм–ҙ мқҳ(зҫ©)лҘј л°”лҘҙкІҢ н•ҳкі мқҙм№ҳлҘј к¶Ғкө¬н•ЁмңјлЎң м„ м„ұ(е…ҲиҒ– : кіөмһҗ)мқҳ л°ңнҳ„(зҷјзҸҫ)н•ҳм§Җ лӘ»н•ң л°”лҘј л°ңнҳ„(зҷјзҸҫ)н•ҳм—¬ мҳЁм¶•(иҳҠи“„)н•ҳлӢҲ мқҙлҠ” кі§ *мһҘмһҗ(ејөеӯҗ)мқҳ н•ҷл¬ёмқҙмҡ”, м–ҙм°Ң к·јліёлҗҳлҠ” л°”к°Җ м—Ҷм–ҙлҸ„ к·ёлҹҙк°Җмҡ”? мқјмӢ¬(дёҖеҝғ)мңјлЎң мЎ°нҷ”(йҖ еҢ–)мқҳ к·јмӣҗ(ж №жәҗ)мқ„ к¶ҒлҰ¬(зӘ®зҗҶ)н•ҳм—¬ мқјмӢ (дёҖиә«)мңјлЎң мІңм§Җ(еӨ©ең°)мқҳ мҡҙ(йҒӢ)мқ„ ліҙм•„ мӮ¬л¬ј(дәӢзү©)мқҳ мқҙм№ҳлҘј 갖추лҠ” мЈјмһҗ(жңұеӯҗ)мқҳ н•ҷл¬ёмқҖ м–ҙм°Ң к·јліёлҗҳлҠ” л°”к°Җ м—Ҷмқҙ к·ёлҹ¬н• кІғмқёк°Җмҡ”? м „н•ҳ(ж®ҝдёӢ)лҠ” мӮјлҢҖ(дёүд»Ј) мқҙмғҒмқҳ л¬ё(ж–Ү)м—җ нӣ„лҢҖ(еҫҢд»Ј)мқҳ м ңмң (и«ёе„’)мқҳ н•ҷл¬ёмқҖ мқҙлҘј м–»м–ҙм„ң мһҗмғҒн•ҳкі мқҙлҘј м„Ө(иӘӘ)н•ҳм—¬ к№ҠмқҢмңјлЎң к·ё л°ңнҳ„н•ң м—¬лҹ¬ м–ём„Ө(иЁҖиӘӘ)мқҙ к°ҷмқҙ нҒ¬кІҢ м°ёлӢӨмҷҖ мІңл…„мқҳ пјҠмӮ¬л¬ё(ж–Ҝж–Ү)м—җ н•ҳлӮҳмқҳ нҒ° лӢӨн–үмһ…лӢҲлӢӨ. мӢ мқҖ 진л¶Җ(йҷіи…җ)н•ң л§җмқ„ мЈјм–ҙ лӘЁм•„ м•һм—җ лҢҖлһө 진мҲ 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мІӯн•ҳмҳөкұҙлҢҖ лӢ№кёҲ(當д»Ҡ)мқҳ мқјлЎң мҚЁ л§Ҳм№ҳкІ мҠөлӢҲлӢӨ. мӢ мқҙ мғқк°Ғн•ҳмҳөкё°м—җ л¬ё(ж–Ү)мқҙлқј н•ЁмқҖ лҸ„(йҒ“)лҘј мӢӨмқҖ к·ёлҰҮмһ…лӢҲлӢӨ. м•„л§Ҳ мЎ°м •(жңқе»·)м—җ мғҒлӢ¬(дёҠйҒ”)лҗҳл©ҙ лӘЁл“ 8)м „мһҘ(е…ёз« )м—җ лІ н’Җм–ҙм§Җкі лӘЁл“ м •мӮ¬(ж”ҝдәӢ)м—җ мЎ°мІҳ(жҺӘиҷ•)лҗҳл©ҙ мІңн•ҳк°Җ нҳ„м—°(йЎҜ然)н•ҳм—¬ мӮ¬л¬ё(ж–Ҝж–Ү)мқҙ ліөмқ„ лҲ„лҰ¬кі к·ё л“ңлҹ¬лӮҳм§Җ м•„лӢҲн•Ём—җ лҜёміҗм„ңлҠ” мӮ¬мҡ°(её«еҸӢ)мқҳ мӮ¬мқҙм—җ нҳ•м„ұ(еҪўжҲҗ)лҗң м—¬лҹ¬ л¬ёлӢө(е•Ҹзӯ”)мқҙ м—¬лҹ¬ м ҖмҲ (и‘—иҝ°)м—җм„ң лӮҳнғҖлӮңмҰү мІңн•ҳ(еӨ©дёӢ)к°Җ мқҖм—°(йҡұ然)нһҲ мӮ¬л¬ё(ж–Ҝж–Ү)мқҳ лҚ•нғқ(еҫ·жҫӨ)мқ„ мһ…мҠөлӢҲлӢӨ. кіөкІҪнһҲ мғқк°Ғн•ҳмҳөкұҙлҢҖ м•„мЎ°(жҲ‘жңқ)мқҳ м—ҙм„ұ(пҰңиҒ–)к»ҳм„ңлҠ” м„ңлЎң мқҙм–ҙ л№ӣмқҙ кІ№м№ҳм–ҙ нғңнҸүн•ң м„ёмӣ”мқҙ кі„мҶҚлҗҳм–ҙм„ң мңЎкІҪ(六經)мқ„ мЎҙмҲӯн•ҳм—¬ лҶ’мқҙкі л°ұк°Җ(зҷҫ家)лҘј л¬јлҰ¬міӨмҠөлӢҲлӢӨ. м „н•ҳм—җ мқҙлҘҙлҹ¬м„ңлҠ” л¬ёмҳҲ(ж–Үи—қ)лҘј мҲӯмғҒн•Ёмқ„ м§Җмјң мһғм§Җ м•„лӢҲн•ҳлӢҲ мҳҲм•…(пҰ¶жЁӮ)мқҙ нҷҳн•ҳкІҢ л°қм•ҳмңјл©° мқёмқҳ(д»Ғзҫ©)лҘј лӘёмҶҢ н–үн•ЁмңјлЎңмҚЁ м•„лһҳ мӮ¬лһҢл“Өмқ„ кұ°лҠҗлҰ¬кі лҸ„н•ҷ(йҒ“еӯё)мқ„ м•һм„ң мқёлҸ„н•ЁмңјлЎңмҚЁ мғҲ м„ л№„лЎңмҚЁ мқөнһҲлҸ„лЎқ 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м§ҖкёҲмқҳ мң мһҗ(е„’иҖ…)лҠ” м„ұкІҪ(иҒ–經)мқҳ мӢ¬мҳӨ(ж·ұеҘ§)н•ң мқҙм№ҳлҘј к¶Ғкө¬н•ҳм§Җ м•Ҡкі пјҠл¶Җнҷ”(жө®иҸҜ)н•ң л¬ё(ж–Ү)мқ„ лӢӨнҲ¬м–ҙ мҲӯмғҒн•ҳлӢҲ лІјмҠ¬мқ„ л§Өк°ңн•ҳлҠ” мёөкі„лЎң мғқк°Ғн•ЁмңјлЎң л¬ёмһҘ(ж–Үз« )мқҖ л§җлЎң лҚ”мҡұ 비н•ҳ(еҚ‘дёӢ)лҗҳкі н’ҚмҶҚмқҖ лӮ лЎң лҚ”мҡұ м•јл°•н•ҳм—¬мЎҢмҠөлӢҲлӢӨ. м•„л§ҲлҸ„ мҳӣмқҳ л¬ё(ж–Ү)н•ЁмқҖ лң»мқ„ лӢӨн•ҳкі кё°көҗм—җлҠ” лӢӨн•ҳм§Җ м•„лӢҲн•ҳл©° 진мӢӨн• лҝҗмқҙлӢҲ лӮЁм—җкІҢ л¶ҖлҰјмқ„ л°ӣм§Җ м•„лӢҲн•©лӢҲлӢӨ. мҳӣ мӮјлҢҖ(дёүд»Ј)мқҳ мҮ мһ”(иЎ°ж®ҳ)мңјлЎң н•ҷкөҗлҠ” нҸҗн•ҳм—¬ м“ёлӘЁм—ҶкІҢ лҗҳл©° м„ұн•ҷ(иҒ–еӯё)мқҖ л°қм§Җ лӘ»н•ҳмҳҖмҠөлӢ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к·ёк°Җ мҳӨнһҲл Ө нӣ„м„ёліҙлӢӨ м–ҙ진 к№ҢлӢӯмқҖ м„ л№„к°Җ кіјкұ°(科擧)мқҳ мқҙлЎңмӣҖмқҙ мһҲмқҢмқ„ м•Ңм§Җ лӘ»н•ҳмҳҖмңјлҜҖлЎң к·ё м–ём–ҙ(иЁҖиӘһ)мҷҖ л¬ёмһҘ(ж–Үз« )мқҙ 비лЎқ лҠҘнһҲ м„ұмқё(иҒ–дәә)м—җкІҢ лӢӨлҠ” нҶөн•ҳм§Җ лӘ»н•ҳмҳҖлӢӨ н• м§ҖлқјлҸ„ лӘЁл‘җ нғҒм—°(еҚ“然)н•ҳм—җ м“ёл§Ңн•Ём—җ к°Җк№Ңмӣ мҠөлӢҲлӢӨ. м§ҖкёҲмқҳ мӢңлҢҖмқё мҰү мқҙм—°(異然)н•ҳм—¬ м„ёмғҒмқҳ мң мһҗ(е„’иҖ…)л“Өмқҙ мһҗкё°лҘј мһҠкі лӮЁмқ„ л”°лқј нҷң мҸҳкё° н•ҳкё°м—җ нһҳм“°кұ°лӮҳ лҢҖмұ…(е°Қзӯ–)․мӮ¬кё°(еҸІиЁҳ)․кіјкұ°(科擧) л“ұмқҳ л¬ё(ж–Ү)м—җ нһҳмҚЁ к·ё м–ём–ҙ(иЁҖиӘһ)к°Җ 비лЎқ м„ұмқё(иҒ–дәә)мқ„ л°°л°ҳн•ҳм§ҖлҠ” м•Ҡм•ҳлӢӨн• м§ҖлқјлҸ„ лӘЁл‘җ мӮ¬мһҘ(и©һз« )м—җ л„ҳміҗ нқҳлҹ¬ мӢӨмҡ©(еҜҰз”Ё)м—җлҠ” л¶Җм Ғ(пҘ§йҒ©)н•©лӢҲлӢӨ. мӢ мқҖ н•ӯмғҒ мқјмңјкё°лҘј мЎ°․л¬ө․кіөмҶҗ(жҷҒеўЁе…¬еӯ«)мқҳ нҢЁкұ°лҰ¬лҠ” лӘЁл‘җ кіјкұ°(科擧)мқҳ лҲ„(пҘҸ)к°Җ мһҲмҠөлӢҲлӢӨ. н•ҳл¬јл©° к·ё м•„лһ«мӮ¬лһҢм—җ мһҲм–ҙм„ңлҰ¬мҳӨ. л°©кёҲ л¬ё(ж–Ү)мңјлЎңмҚЁ м„ л№„лҘј лҪ‘мңјлӮҳ мқҙлҘј лІ•лҸ„лЎңмҚЁ л°”лҘҙкІҢ н•ҳкі мқҙлҘј мң мӮ¬(жңүеҸё)м—җкІҢм„ң кі м°°н•©лӢҲлӢӨ. мӢ мқҙ л‘җл ӨмӣҢн•ЁмқҖ н•ңк°“ кіөм–ё(з©әиЁҖ)мқҙ мһҲмқ„ лҝҗмқҙлӢҲ мӢ¬нһҲ мһҳлӘ»лҗЁмқҖ к·јлһҳмқҳ мқҙлҘё л°” л¬ё(ж–Ү)мқҙлқјлҠ” кІғмһ…лӢҲлӢӨ. м—Һл“ңлҰ¬м–ҙ мғқк°Ғн•ҳмҳөкұҙлҢҖ м „н•ҳк»ҳмҳөм„ңлҠ” лҚ”мҡұ лҸҲлҸ…нһҲ мӢӨлӢӨмӣҖмқ„ лӘёмҶҢ н–үн•ҳмӢңмҷҖ к·ё л¶Җнҷ”(жө®иҸҜ)мқҳ мҠөкҙҖмқ„ м–өм ңн•ҳкі мһ¬мҳҲ(жүҚи—қ)мқҳ н•ҳм°®мқҖ лҒқл§Ң кө¬н•ҳм§Җ л§ҲмӢңкі л§Ҳл•…нһҲ к·ё лҸ„лҚ•мқҳ мӢӨлӢӨмӣҖмқ„ мӮҙн”јл©ҙ м„ёмғҒмқҙ 비лЎқ мӮјлҢҖмқҙн•ҳ(дёүд»Јд»ҘдёӢ)мқҳ л¬ё(ж–Ү)мқҙлқјн• м§ҖлқјлҸ„ мһҗм—°нһҲ мӮјлҢҖмқҙмғҒ(дёүд»Јд»ҘдёҠ)мқҳ л¬ё(ж–Ү)мқҙ лҗ кІғмһ…лӢҲлӢӨ. мӢ мқҖ м–ҙм°Ңн•ҳм—¬ лӢӨн–үнһҲлҸ„ м Җмқҳ лӘём—җ м№ңнһҲ мқҙлҘј лӮҳнғҖлӮјк№Ң н•©лӢҲлӢӨ. мӢ мқҖ мӮјк°Җ лҢҖлӢөн•ҳлӮҳмқҙлӢӨ
1) мӮ¬м„қ(её«еёӯ) : мҠӨмҠ№мқҳ мһҗлҰ¬. м„ұк· кҙҖмқҳ мҡ”м§Ғл“ӨмқҖ м„ұк· кҙҖ мң мғқмқ„ к°ҖлҘҙм№ЁмңјлЎң мқҙлҘҙлҠ” л§җ. пјҠ мұ…л¬ё(зӯ–е•Ҹ) : мһ„кёҲмқҙ м •м№ҳмғҒмқҳ л¬ём ңлҘј 묻лҠ” мқј. пјҠ мҹҒмӢ (и«ҚиҮЈ) : мһ„кёҲмқҳ мһҳлӘ»мқ„ м§Ғм–ё(зӣҙиЁҖ)мңјлЎң к°„н•ҳлҠ” 충мӢ . пјҠ ліҙмқө(иј”зҝј) : лҸ„мӣҖ, ліҙмўҢ(иј”дҪҗ)н•Ё. пјҠ к°„кҙҖ(и««е®ҳ) : көӯмҷ•мқҳ мІҳмӮ¬м—җ лҢҖн•ң к°„мҹҒ(и««и«Қ)кіј л…јл°•(пҘҒй§Ғ)мқ„ кҙҖмһҘн•ҳлҠ” мӮ¬к°„мӣҗ(еҸёи««йҷў)мқҳ лҢҖмӮ¬к°„(еӨ§еҸёи««) мқҙн•ҳ м •м–ё(жӯЈиЁҖ)к№Ңм§Җмқҳ лІјмҠ¬м•„м№ҳ. пјҠ мҲҳм„ (йҰ–йҒё) : кіјкұ°(科擧)м—җм„ң мһҘмӣҗмңјлЎң лҪ‘нһҳ. мІ«м§ёлЎң лҪ‘нһҳ. пјҠ лҢҖк°„(иҮәи««) : мӮ¬н—Ңл¶Җ(еҸёжҶІеәң), мӮ¬к°„мӣҗ(еҸёи««йҷў)мқҳ лІјмҠ¬м•„м№ҳ. пјҠ ліөн•©(дјҸй–Ө) : лӮҳлқјм—җ нҒ° мқјмқҙ мһҲмқ„ м Ғм—җ мЎ°мӢ (жңқиҮЈ) лҳҗлҠ” мң мғқ(е„’з”ҹ)мқҙ лҢҖк¶җл¬ё л°–м—җ мқҙлҘҙлҹ¬ мғҒмҶҢ(дёҠз–Ҹ)н•ҳкі м—Һл“ңл Ө мІӯн•ҳлҠ” мқј. 2) кІ°мҠ№(зөҗ繩) : нғңкі мӢңлҢҖ л¬ёмһҗк°Җ м—Ҷмқ„ л•Ң лҒҲмқҳ л§Өл“ӯмңјлЎң м•ҪмҶҚмқҳ л¶ҖнҳёлЎң мӮјмқҢ. пјҠ л¬ё(ж–Ү) : нҳ„мғҒ(зҸҫиұЎ), лІ•лҸ„(жі•еәҰ). кёҖмһҗ. пјҠ н•ҳлҸ„лӮҷм„ң(жІіең–пӨ•жӣё) : н•ҳлҸ„(жІіең–)лҠ” ліөнқ¬(дјҸзҫІ)л•Ң нҷ©н•ҳм—җм„ң лӮҳмҳЁ лҸ„нҳ•. лӮҷм„ң(пӨ•жӣё)лҠ” мҡ°мҷ•(зҰ№зҺӢ)мқҙ нҷҚмҲҳлҘј лӢӨмҠӨл ёмқ„ л•Ң лӮҷмҲҳ(пӨ•ж°ҙ)м—җм„ң лӮҳмҳЁ мӢ к·Җ(зҘһпӨҮ)мқҳ л“ұм—җ м“°мқҙм–ҙ мһҲм—ҲлӢӨлҠ” кёҖлЎңм„ң нҷҚлІ”(жҙӘзҜ„)мқҳ мӣҗліёмқҙ лҗңкІғ. пјҠ лӢ№мҡ°(е”җиҷһ) : мҡ”мҲң(е ҜиҲң). пјҠ мӮјлҢҖ(дёүд»Ј) : мӨ‘көӯмқҳ н•ҳ ․ мқҖ ․ мЈј(еӨҸж®·е‘Ё)мқҳ м„ёмҷ•мЎ° пјҠ мҲңкІҪ(иҚҖеҚҝ) : м „көӯмӢңлҢҖмқҳ н•ҷмһҗ. м„ұм•…м„Ө(жҖ§жғЎиӘӘ)мқҖ мЈјмһҘ. пјҠ л¬өм Ғ(еўЁзҝҹ): кІём• (е…јж„ӣ) ․ мҲӯкІҖм„Ө(еҙҮе„үиӘӘ)мқ„ мЈјмһҘ. пјҠ м–‘мЈј(жҘҠжңұ) : к·№лӢЁмқҳ мқҙкё°мЈјмқҳлҘј мЈјмһҘ, л¬өм Ғкіј лҢҖлҰҪ. пјҠ мҷ•мҲҳмқё(зҺӢе®Ҳд»Ғ) : (1472~1529) лӘ…мқҳ н•ҷмһҗ. м–‘лӘ…н•ҷ(йҷҪжҳҺеӯё)мқ„ м„ёмӣҖ. пјҠ н•ңмһҗ(йҹ“еӯҗ) : н•ңмң (йҹ“ж„Ҳ) (768~824) мӨ‘лӢ№(дёӯе”җ)мқҳ л¬ёнҳё. мң мў…мӣҗ(жҹіе®—е…ғ)кіј н•Ёк»ҳ кі л¬ё(еҸӨж–Ү) л¶ҖнқҘм—җ нһҳм”Җ. пјҠ кө¬м–‘мҲҳ(жӯҗйҷҪи„©) : (1007~1072) л¶ҒмҶЎ(еҢ—е®Ӣ)мқҳ м •м№ҳк°Җ л¬ёмқё, лӢ№мҶЎ 8лҢҖк°Җмқҳ н•ңмӮ¬лһҢ. 3) м„ұмұ… : мғҒк°җмқҙ мғқк°Ғн•ҳлҠ” лҢҖмұ…. пјҠ мЎ°лҰј : н•ҙмҷҖ лӢ¬кіј лі„мқҙ мң„м—җм„ң 비м¶Ө. пјҠ м–‘мқҳ(пҘёе„Җ) : мІңм§Җ(еӨ©ең°), мқҢм–‘(йҷ°йҷҪ). пјҠ мӮјмһ¬(дёүжүҚ) : мІңм§Җмқё(еӨ©ең°дәә). пјҠ кө¬мЈј(д№қз–Ү) : кё°мһҗ(з®•еӯҗ)к°Җ мЈј(е‘Ё)мқҳ л¬ҙмҷ•(жӯҰзҺӢ)мқҳ л¬јмқҢм—җ лӢөн•ң мІңн•ҳлҘј лӢӨмҠӨлҰ¬лҠ” 9к°Җм§Җ лҢҖлІ•(еӨ§жі•) кі§. мҳӨн–ү(дә”иЎҢ) ․ мҳӨмӮ¬(дә”дәӢ) ․ нҢ”м •(е…«ж”ҝ) ․ мҳӨкё°(дә”зҙҖ) ․ нҷ©к·№(зҡҮжҘө) ․ мӮјлҚ•(дёүеҫ·) ․ кі„мқҳ(зЁҪз–‘) ․ м„ң징(еә¶еҫө) ․ мҳӨліө(дә”зҰҸ) ․ мңЎк·№(六жҘө). пјҠ мҳЁм¶•(иҳҠи“„) : мҳӨлһң лҸҷм•Ҳ 충분нһҲ м—°кө¬н•ҙм„ң мҢ“м•„ лҶ“мқҖ н•ҷл¬ёмқҙлӮҳ кё°мҳҲ л”°мң„мқҳ к№ҠмқҖ м§ҖмӢқ. пјҠ м „лӘЁ(е…ёи¬Ё) : мҳӣ м„ұнҳ„мқҳ нӣҲкі„(иЁ“жҲ’), мҡ”м „(е Ҝе…ё), мҲңм „(иҲңе…ё), мҡ°лӘЁ(зҰ№и¬Ё) л“ұ пјҠ мҡ°л¶Ҳм§Җм–ё(еҸҲ咈д№ӢиЁҖ) : л¶Ҳм°¬м„ұмқ„ н‘ңмӢңн•ҳлҠ” л§җ. пјҠ м„ңлӘ…(иӘ“е‘Ҫ) : мһ„кёҲмқҙ мӢ н•ҳм—җ лҢҖн•ҳм—¬ лӘ…н•ҳлҠ” кёҖ. м „лӘЁ(е…ёжЁЎ) ․ нӣҲкі (иЁ“иӘҘ) ․ м„ңлӘ…(иӘ“е‘Ҫ) л“ұмқҳ кёҖмІҙк°Җ мһҲлӢӨ. 4) мЈјм—ӯ(зҙ¬з№№) : мӢӨл§ҲлҰ¬лҘј лҪ‘м•„ лӮҙм–ҙ м°ҫмқҢ пјҠ ліҖм„Ө(еҚһиӘӘ) : иҫЁиӘӘ, мӮ¬лҰ¬лҘј 분별н•ҳм—¬ м„ӨлӘ…н•Ё. пјҠ мҲҳкё°м№ҳмқём§ҖлҸ„(дҝ®е·ұжІ»дәәд№ӢйҒ“) : лӮҙ лӘёмқ„ лӢҰм•„, лӮЁмқ„ көҗнҷ”(ж•ҺеҢ–)н•ҳлҠ” лҸ„лҰ¬. пјҠ м„ұлӘ… лҸ„лҚ•(жҖ§е‘ҪйҒ“еҫ·) : мІңм„ұ(еӨ©жҖ§)кіј лҸ„лҚ•. пјҠ к°•лӘ…(и¬ӣжҳҺ) : мӮ¬лҰ¬(дәӢзҗҶ)лҘј к°•кө¬(и¬ӣ究)н•ҳм—¬ 분лӘ…нһҲ н•Ё. пјҠ мЎ°мң (и©”и«ӯ) : мЎ°м„ң(и©”жӣё)лҘј лӮҙл Өм„ң нҡЁмң (жӣүи«ӯ)н•Ё. пјҠ м•јк°қ(йҮҺе®ў) : мӮ°м•ј(еұұйҮҺ)м—җ мӮ¬лҠ” мӮ¬лһҢ. пјҠ лӮңлҰү(пӨҹйҷө) : мҲңкІҪ(иҚҖеҚҝ)мқ„ л§җн•Ё. лӮңлҰүл №(пӨҹйҷөд»Ө)мқ„ м§ҖлғҲмқҢ. пјҠ м–‘мӣ…(жҘҠйӣ„) : (м „53~18), н•ң(жјў) м„ұлҸ„мқё(жҲҗйғҪдәә), к°ҖлӮңм—җлҸ„ л§ҲмқҢмқҙ нҺём•Ҳн•ҳл©° м„ұмқёмқҳ м„ң(жӣё)к°Җ м•„лӢҲл©ҙ мўӢм•„н•ҳм§Җ м•Ҡм•ҳлӢӨ. пјҠ нғңнҳ„(еӨӘзҺ„) : н—Ҳл¬ҙл…җлӢҙ(иҷӣз„ЎжҒ¬ж·Ў)мқҳ йҒ“лҘј л§җн•ң еӨӘзҺ„經. пјҠ мҷ•нҶө(зҺӢйҖҡ) : (584~618), мҲҳ(йҡӢ)мқҳ н•ҷмһҗ, мҷ•л°ң(зҺӢеӢғ)мқҳ мЎ°л¶Җ. пјҠ м°ём Ҳ(еғӯз«Ҡ) : 분м—җ л„ҳм№ҳлҠ” лҶ’мқҖ мһҗлҰ¬м—җ мһҲмқҢ. пјҠ м„ұмұ…(иҒ–зӯ–) : мһ„кёҲмқҙ мғқк°Ғн•ҳлҠ” лҢҖмұ…(е°Қзӯ–). пјҠ л°ұкіө(дјҜеҠҹ) : кіөмқ„ м•һм„ёмҡ°лӢӨ. кіөмқ„ к°ҖмһҘ мң„лЎң м„ёмҡ°лӢӨ. 5) мҠ№к°•(еҚҮйҷҚ) : м„ұ(зӣӣ)н•ҳкі мҮ (иЎ°)н•Ё. мҳӨлҘҙлӮҙлҰј. 6) м§ҲмӢӨ(иіӘеҜҰ) : кҫёл°Ҳ м—Ҷкі м§„мӢӨн•Ё. пјҠ м•Ңл¬ҳ(揠иӢ—) : кіЎмӢқмқ„ л№ЁлҰ¬ лҗҳкІҢ кі к°ұмқҙлҘј лҪ‘м•„ мҳ¬лҰ°лӢӨлҠ” лң»мңјлЎң, м„ұкіөмқ„ м„ңл‘җлҘҙлӢӨк°Җ лҸ„лҰ¬м–ҙ н•ҙлҘј лҙ„мқ„ мқҙлҘҙлҠ” л§җ. пјҠ мҡ•мҶҚл¶ҖлӢ¬(ж¬ІйҖҹпҘ§йҒ”) : л„Ҳл¬ҙ л№ЁлҰ¬н•ҳл Өкі м„ңл‘җлҘҙл©ҙ лҸ„лҰ¬м–ҙ мқјмқ„ мқҙлЈЁм§Җ лӘ»н•Ё. пјҠ м°Ҫл Ө(жҳҢй»Һ) : (768~824) н•ңмң (йҹ“ж„Ҳ)мқҳ нҳё. м°Ҫл Өм„ мғқмқҙлқј л¶Ҳл Җмңјл©° мӨ‘лӢ№(дёӯе”җ)мқҳ л¬ёнҳё(ж–ҮиұӘ). пјҠ мӣҗлҸ„(еҺҹйҒ“) : мқёлҸ„(дәәйҒ“)мқҳ к·јліё. лӢ№(е”җ)мқҳ н•ңмң (йҹ“ж„Ҳ)к°Җ м§ҖмқҖ мң лҸ„(е„’йҒ“)мқҳ мӣҗлҰ¬лҘј л°қнһҢ л¬ёмһҘ(ж–Үз« )мқҙлҰ„. пјҠ лӘ…көҗ(еҗҚж•Һ) : мқёлҘң лҸ„лҚ•м—җ кҙҖн•ң к°ҖлҘҙм№Ё. мң кі (е„’ж•Һ)лҘј мқҙлҘёлӢӨ. пјҠ л¶ҲкіЁ(дҪӣйӘЁ) : л¶ҖмІҳмқҳ мң кіЁ, мӮ¬лҰ¬(иҲҚеҲ©). пјҠ 8лҢҖ : лҸҷн•ң(жқұжјў), мң„(йӯҸ), 진(жҷӢ), мҶЎ(е®Ӣ), м ң(йҪҠ), м–‘(пҘә), 진(йҷі), мҲҳ(йҡӢ). пјҠ кө¬м–‘кіө(жӯҗйҷҪе…¬) : (1007~1072), кө¬м–‘мҲҳ(жӯҗйҷҪдҝ®), лӢ№мҶЎ8лҢҖк°Җ. пјҠ кі м•„(еҸӨйӣ…) : мҳҲмҠӨлҹ¬мӣҢ м•„м№ҳ(йӣ…иҮҙ)к°Җ мһҲмқҢ. пјҠ мҶҢмҶҢ(з°«йҹ¶) : мҲң(иҲң) мһ„кёҲмқҙ л§Ңл“ кіЎмЎ°(жӣІиӘҝ)мқҳ мқҙлҰ„. пјҠ н—ҳкҙҙ(йҡӘжҖӘ) : н—Өм•„лҰ¬кё° нһҳл“Өкі мқҳмӢ¬мҠӨлҹ¬мӣҖ пјҠ мӮ¬мһҘ(иҫӯз« ) : л¬ёмһҘ мӢңл¶Җ(ж–Үз« и©©иіҰ)лҘј мқҙлҰ„. пјҠ мҲҳмһҗ(ж•ёеӯҗ) : лӘҮ 분. пјҠ м–өм„Ө(иҮҶиӘӘ) : к·јкұ°мҷҖ мқҙмң к°Җ м—Ҷмқҙ кі м§‘мқ„ м„ёмҡ°лҠ” л§җ. 7) мұ…л¬ё(зӯ–ж–Ү) : мұ…л¬ё(зӯ–е•Ҹ)м—җ лӢөн•ҳлҠ” кёҖ. пјҠ мЈјкіө(е‘Ёе…¬) : мЈјл¬ёмҷ•(е‘Ёж–ҮзҺӢ)мқҳ м•„л“Ө, л¬ҙмҷ•(жӯҰзҺӢ)мқҳ м•„мҡ°. пјҠ м—јкі„(жҝӮжәӘ) : мӨ‘көӯ нҳёлӮЁм„ұм—җ мһҲлҠ” лӮҙ мқҙлҰ„мңјлЎң л¶ҒмҶЎ(еҢ—е®Ӣ)мқҳ н•ҷмһҗ мЈјлҸҲмқҙ(е‘Ёж•Ұ頤)лҘј мқҙлҰ„, мқҙ н•ҷнҢҢ(еӯёжҙҫ)лҘј м—јкі„н•ҷнҢҢлқј н•Ё. пјҠ мӨҖм„Ө(жөҡжё«) : л¬ј л°‘л°”лӢҘмқ„ міҗлӮҙм–ҙ к№ЁлҒ—н•ҳкі к№ҠкІҢн•Ё. пјҠ мқҙлқҪ(дјҠжҙӣ) : м •мЈјн•ҷ(зЁӢжңұеӯё)мқ„ л§җн•Ё. мқҙ(дјҠ)лҠ” мқҙмІң(дјҠе·қ), лӮҷ(пӨ•)мқҖ лӮҷм–‘(пӨ•йҷҪ)мңјлЎң, мқҙмІңмқҖ м •мһҗ(зЁӢеӯҗ) ․ лӮҷм–‘мқҖ мЈјмһҗк°Җ мһҲлҚҳ кіі пјҠ кҙҖлҜј(й—ң閩) : кҙҖмӨ‘(й—ңдёӯ)мқҳ мһҘмһ¬(ејөијү) кі§ мһҘмһҗмҷҖ лҜјмӨ‘(閩дёӯ)мқҳ мЈјнқ¬(жңұзҶ№) кі§ мЈјмһҗлҘј л§җн•Ё. пјҠ кІҪм„ұ(жҷҜжҳҹ) : нҒ°лі„, кІҪмӮ¬мҠӨлҹ¬мҡё л•Ң лӮҳмҳҙ. пјҠ нғңмӮ°л¶Ғл‘җ(жі°еұұеҢ—ж–—) : нғңмӮ°кіј л¶Ғл‘җм„ұ, лӘЁл“ мӮ¬лһҢмқҙ мЎҙкІҪн•ҳлҠ” лӣ°м–ҙлӮң мқёл¬јмқ„ 비мң н•ҳм—¬ мқҙлҘҙлҠ” л§җ. пјҠ нҶөм„ң(йҖҡжӣё) : мұ…мқҳ мқҙлҰ„, мҶЎ(е®Ӣ)лӮҳлқј мЈјлҸҲмқҙ (е‘Ёж•Ұ頤)мқҳ м ҖмҲ , мІҳмқҢ мқҙлҰ„мқҖ м—ӯнҶө(жҳ“йҖҡ). пјҠ мҳҘлЈЁ(еұӢжјҸ) : л°©м•Ҳмқҳ м„ңл¶Ғ к·ҖнүҒмқҙм—җм„ң мӨ‘лҘҳ(дёӯ霤)мқҳ мӢ (зҘһ)мқ„ м ңмӮ¬ м§ҖлӮҙлҠ” кіі. кі§ мӮ¬лһҢмқҙ мһҳ ліҙм§Җ м•ҠлҠ” кө¬м„қ진 кіімқ„ л§җн•ңлӢӨ. пјҠ мһҘмһҗ(ејөеӯҗ) : мһҘмһ¬(ејөијү) (1020~1077), л¶ҒмҶЎ(еҢ—е®Ӣ)мқҳ н•ҷмһҗ, нҡЎкұ°(ж©«жё ) м„ұмғқмқҙлқј н•Ё. пјҠ мӮ¬л¬ё(ж–Ҝж–Ү) : мң көҗмқҳ лҸ„мқҳ лҳҗлҠ” к·ё л¬ёнҷ”, мң н•ҷмһҗ(е„’еӯёиҖ…)лҘј лҶ’мқҙм–ҙ мқҙлҘҙлҠ” л§җ. 8) м „мһҘ(е…ёз« ) : н•ң лӮҳлқјмқҳ м ңлҸ„мҷҖ л¬ёл¬ј. лІ•м№ҷ, к·ңм№ҷ, мһҘм „(з« е…ё). пјҠ л¶Җнҷ”(жө®иҸҜ) : кІүліҙкё°л§Ң нҷ”л Өн•ҳкі мӢӨмҶҚмқҙ м—ҶмқҢ. пјҠ мЎ°․л¬ө․кіөмҶҗ(жҷҒеўЁе…¬еӯ«) : мЎ°ліҙм§Җ(жҷҒиЈңд№Ӣ) ․ л¬өм Ғ(еўЁзҝҹ) ․ кіөмҶҗмҡ©мһҗ(е…¬еӯҗ龍еӯҗ)л“ұмқҳ мһЎк°Җ(йӣң家).
в—Һн•ҙлҸҷм•јм–ё 3 м—°мӮ°кө°(зҮ•еұұеҗӣ) н—Ҳлҙү1971л…„
в—Ӣ м •м–ё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ҳ мһҗлҠ” мӮ¬кі (её«еҸӨ)мқҙл©° м–ҙлҰҙм Ғ мқҙлҰ„мқҖ н•ҷмқҙ(еӯёиҖҢ)мқҙлӢӨ. лӘ…лҰ¬лҘј л– лӮң кі мғҒн•ң мқҙм•јкё°лҘј нҒ°мҶҢлҰ¬лЎң л§җн•ҳл©° кіҒм—җ мӮ¬лһҢмқҙ м—ҶлҠ” кІғмІҳлҹј н•ҳмҳҖлӢӨ. м—°мӮ°кө°мқҙ н•Ёл¶ҖлЎң л¬ёмӮ¬(ж–ҮеЈ«)л“Өмқ„ л§Һмқҙ мЈҪмқҙлҜҖлЎң л“ңл””м–ҙ лҸ„л§қн•ҙ мҲЁм—ҲлӢӨк°Җ л’Өм—җ мҠӨмҠӨлЎң м„ёмғҒм—җ лӮҳмҷҖм„ң лӘ©мҲЁмқ„ ліҙм „н•ҳм§Җ лӘ»н•ҳмҳҖлҠ”лҚ°, мӢқмһҗл“Өмқҙ кё°лЎұн•ҳмҳҖлӢӨ. гҖҠмӮ¬мҡ°м–ён–үлЎқгҖӢ
в—Һм—°л ӨмӢӨкё°мҲ м ң4к¶Ң л¬ёмў…мЎ° кі мӮ¬ліёл§җ(ж–Үе®—жңқж•…дәӢжң¬жң«) мҶҢлҰү(жҳӯйҷө)мқҳ нҸҗмң„мҷҖ ліөмң„ мқҙкёҚмқө(п§ЎиӮҜзҝҠ)1966л…„
в—Ӣ м—°мӮ°(зҮ•еұұ) 2л…„(1496)м—җ лҢҖмӮ¬к°„к№Җк·№лүө(йҮ‘е…Ӣ?)кіј мӮ¬к°„мқҙмқҳл¬ҙ(жқҺе®ңиҢӮ), лӮ© к№ҖмқјмҶҗ(йҮ‘йҰ№еӯ«), м–ё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.мқҙмЈј(жқҺ?) л“ұмқҙ н—Ңмқҳ(зҚ»иӯ°)н•ҳм—¬ м•„лў°кё°лҘј, вҖңмӢ л“ұмқҙ мғқк°ҒкұҙлҢҖ л¬ёмў…мқҳ мӣҗ비(е…ғеҰғ) к¶Ңм”Ёмқҳ мЈҪмқҢмқҙ л…ёмӮ° мқҙм „мқҙм—ҲлҠ”лҚ°лҸ„ мқҙлҘј лҸҷмӢңм—җ нҸҗмң„мӢңмјңм„ң л¬ёмў…л§ҢмқҖ мқјмң„(дёҖдҪҚ)лЎң нқ н–Ҙн•ҳм—¬ м§ҖкёҲк№Ңм§Җ л°°мЎҙ(й…Қе°Ҡ)мқҳ мӢ мЈјк°Җ м—ҶмңјлӢҲ мқҙкІғмқҖ мёЎмқҖн•ң мқјмқҙмҳөлӢҲлӢӨ. м„ұмў…мқҖ мҳҲм „м—җ м ҒлӘ°н•ң 노비л“Өмқ„ л…ёмӮ°к¶Ғмқё(йӯҜеұұе®®дәә) мҶЎм”Ё(е®Ӣж°Ҹ)м—җкІҢ лҸҢл ӨмЈјм–ҙм„ң к·ё мғқнҷңмқ„ лҸ•кІҢ н•ҳмҳҖкі к·ё мқјк°ҖмЎұмҶҚк№Ңм§Җ мӮ¬н•ҳм—¬ лӘЁл‘җ лІјмҠ¬м—җ лӮҳмҳӨкІҢ н•ҳмҳҖмңјлӢҲ м„ұмў…мқҳ м§Җк·№н•ң лң»мқ„ м—¬кё°м„ң лҳҗн•ң ліј мҲҳ мһҲмӮ¬мҳөлӢҲлӢӨ. мӣҗм»ЁлҢҖ, м „н•ҳк»ҳм„ң мҶҢлҰүл¬ҳмЈј(жҳӯйҷөе»ҹдё»)лҘј 추ліөн•ҳм—¬ л¬ёмў…м—җкІҢ л°°мң„н•ҳкІҢ н•ҳмҳӨл©ҙ мў…л¬ҳм—җ лӢӨн–үмқјк№Ң н•ҳмҳөлӢҲлӢӨ.вҖқ н•ҳмҳҖлӢӨ. мқҙ н—Ңмқҳк°Җ мҳҲмЎ°м—җ лӮҙлҰ¬л§Ө мҳҲмЎ°лҠ”, вҖңмҳҲлЎңл¶Җн„° мў…л¬ҳм—җ л°°мң„ м—ҶлҠ” лҸ…мЈј(зҚЁдё»)к°Җ м—ҶлҠ”лҚ°лҸ„ мҡ°лҰ¬ л¬ёмў…мқҖ мў…л¬ҳм—җм„ң нҷҖлЎң м ңн–Ҙмқ„ л°ӣмңјлӢҲ мқҳлҰ¬м—җ мҳЁлӢ№м№ҳ лӘ»н•©лӢҲлӢӨ. к·ёлҹ¬лӮҳ мҶҢлҰүмқ„ мЎ°мў…м—җм„ң нҸҗмң„мӢңнӮЁ м§Җ мқҙлҜё мҳӨлһҳлҗҳм–ҙ кІҪмҶ”н•ҳкІҢ ліөмң„н•ҳкё°к°Җ м–ҙл Өмҡ°лӢҲ кұ°н–үн• мҲҳ м—ҶмҠөлӢҲлӢӨ.вҖқкі м•„лў°м—ҲлӢӨ.
в—Һм—°л ӨмӢӨкё°мҲ м ң6к¶Ң м—°мӮ°мЎ° кі мӮ¬ліёл§җ(зҮ•еұұжңқж•…дәӢжң¬жң«) к°‘мһҗнҷ”м Ғ(з”ІеӯҗзҰҚзұҚ) мқҙкёҚмқө(п§ЎиӮҜзҝҠ)1966л…„
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–ҙлҰҙ л•Ңмқҳ мқҙлҰ„мқҖ н•ҷмқҙ(еӯёиҖҢ)мқҙлӢӨ. лі‘мҳӨл…„м—җ 진мӮ¬кіјм—җ мҳ¬лһҗлӢӨ.н•ңнӣҲмқҖ мһҗлҠ” мӮ¬кі (её«еҸӨ)мқҙл©°, ліёкҙҖмқҖ мІӯмЈј(ж·ёе·һ)мқҙлӢӨ. м„ұмў… к°‘мқёл…„м—җ л¬ёкіјм—җ мҳ¬лқј лІјмҠ¬мқҙ м •м–ём—җ мқҙлҘҙл ҖлӢӨ.в—Ӣ мҳҶ мӮ¬лһҢм—җ м•„лһ‘кіім—Ҷмқҙ нҒ° мҶҢлҰ¬лЎң мІӯлӢҙ(ж·ёи«Ү)мқ„ н•ҳмҳҖлӢӨ. м—°мӮ°мЈјмқҳ мЎ°м •м—җм„ң кёҖн•ҳлҠ” м„ л№„лҘј м–өмҡён•ҳкІҢ л§Һмқҙ мЈҪмҳҖлҠ”лҚ° кіөмқҖ лҸ„л§қн•ҙ мҲЁм—ҲлӢӨк°Җ мһҗ진н•ҳм—¬ лӮҳнғҖлӮҳ мЈҪмқҢмқ„ л©ҙм№ҳ лӘ»н•ҳмҳҖмңјлӢҲ, мӢқмһҗ(иӯҳиҖ…)л“ӨмқҖ к·ёлҘј лӮҳл¬ҙлһҗлӢӨ. гҖҠмӮ¬мҡ°м–ён–үлЎқгҖӢ
в—Һм—°л ӨмӢӨкё°мҲ м ң7к¶Ң мӨ‘мў…мЎ° кі мӮ¬ліёл§җ(дёӯе®—жңқж•…дәӢжң¬жң«) к№Җкіөм Җ(йҮ‘е…¬и‘—)мҷҖ мЎ°кҙ‘ліҙ(и¶ҷе…үиј”)мқҳ мҳҘмӮ¬ мқҙкёҚмқө(п§ЎиӮҜзҝҠ)1966л…„
в—Ӣ мЎ°кҙ‘ліҙлҘј лҢҖк¶җ лң°лЎң мһЎм•„л“ӨмқҙлӢҲ, нҒ° мҶҢлҰ¬лЎң мҳӣ кёҖмқ„ мҷёмҡ°лӢӨк°Җ мң мһҗкҙ‘мқ„ ліҙкі нҒ° мҶҢлҰ¬лЎң л¶ҖлҘҙкё°лҘј, вҖңмң мһҗкҙ‘мқҖ мҶҢмқёмқёлҚ°, м–ҙм°Ң мқҙ мһҗлҰ¬м—җ мһҲлҠ”к°Җ. л¬ҙмҳӨл…„м—җ м–ҙ진 мӮ¬лһҢл“Өмқ„ лӘЁн•Ён•ҙм„ң к№Җмў…м§Ғ(йҮ‘е®—зӣҙ) к°ҷмқҖ мӮ¬лһҢл“Өмқҙ лӘЁл‘җ мЈҪмһ„мқ„ лӢ№н–ҲлҠ”лҚ°, мқҙм ң лҳҗ л¬ҙмҠЁ мқјмқ„ н•ҳл Өкі н•ҳлҠ”к°Җ. мғҒл°©кІҖ(е°ҷж–№еҠҚ)мқ„ м–»м–ҙм„ң м•„мІЁн•ҳлҠ” мӢ н•ҳмқҳ лЁёлҰ¬лҘј лІ кі м„ұмҠӨлҹ¬мҡҙ мһ„кёҲмқ„ л°ӣл“Өкі м–ҙ진 мһ¬мғҒмқ„ мһ„лӘ…н•ҳл©ҙ нӣҢлҘӯн•ң м •м№ҳлҘј ліј мҲҳ мһҲмқ„ кІғмқҙлӢӨ.вҖқ н•ҳлӢҲ, м„ұнқ¬м•Ҳ(жҲҗеёҢйЎ”)мқҙ 묻기лҘј, вҖңм•„мІЁн•ҳлҠ” мӢ н•ҳлһҖ лҲ„кө¬мқёк°Җ.вҖқ н•ҳлӢҲ, мЎ°кҙ‘ліҙк°Җ л§җн•ҳкё°лҘј, вҖңл°”лЎң мң мһҗкҙ‘мқҙлӢӨ.вҖқ н•ҳкі , л°•мӣҗмў…м—җкІҢ л§җн•ҳкё°лҘј, вҖңл„Ҳк°Җ м„ұмҠӨлҹ¬мҡҙ мһ„кёҲмқ„ 추лҢҖн–ҲмңјлӢҲ, кіөмқҙ кіјм—° нҒ¬м§Җл§Ң, м–ҙм°Ң нҸҗмЈј(е»ўдё»)мқҳ лӮҳмқё[е…§дәә]мқ„ лҚ°лҰ¬кі мӮ¬лҠҗлғҗ.вҖқ н•ҳкі , лҳҗ м„ұнқ¬м•Ҳм—җкІҢ лҲҲ짓н•ҳл©° л§җн•ҳкё°лҘј, вҖңк·ё м „м—җ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ҙ л„ҲлҘј лӘ…мң (еҗҚе„’)лқј н–Ҳкұ°лҠҳ, мқҙм ң м–ҙм§ём„ң мң мһҗкҙ‘кіј н•Ёк»ҳ мқјмқ„ н•ҳлҠҗлғҗ.вҖқ н•ҳмҳҖлӢӨ. лҳҗ мӮ¬кҙҖ к°•нҷҚ(е§ңжҙӘ)мқҙл§җ(жқҺжҠ№)мқ„ к°ҖлҰ¬нӮӨл©° л§җн•ҳкё°лҘј, вҖңк°•нҷҚм•„, л„Ө 아비к°Җ мЈ„ м—Ҷмқҙ н”јмӮҙлҗҳм—ҲлӢӨ. л„Ҳнқ¬л“ӨмқҖ мӮ¬кҙҖмқҙлӢҲ л§Ҳл•…нһҲ лӮҙ л§җмқ„ нҠ№лі„нһҲ мҚЁ л‘җлқј.вҖқ н•ҳмҳҖлӢӨ. мһҘ(жқ–)мқ„ м—ҙлҢҖ лӮЁм§“ л§һкі лҸ„ нҶөкіЎл§Ң н•ҳкі л§ҲлӢҲ, л°•мӣҗмў…мқҙ л§җн•ҳкё°лҘј, вҖңм°ёмңјлЎң лҜём№ң лі‘мқҙ л“ мӮ¬лһҢмқҙлЎңлӢӨ.вҖқ н•ҳкі к·ёл§Ңл‘җм—ҲлӢӨ. гҖҠлҸҷк°ҒмһЎкё°гҖӢ
в—Һм—°л ӨмӢӨкё°мҲ 별집 м ң9к¶Ң кҙҖм§Ғм „кі (е®ҳиҒ·е…ёж•…) мқҙкёҚмқө(п§ЎиӮҜзҝҠ)1966л…„
кіјкұ° в…ў л“ұкіј мҙқлӘ©(зҷ»з§‘ж‘ зӣ®) 25л…„ к°‘мқё лі„мӢңм—җм„ң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 л“ұ 22лӘ…мқ„ лҪ‘м•ҳлӢӨ.
в—ҺмӮ¬мҡ°лӘ…н–үлЎқ(её«еҸӢеҗҚиЎҢйҢ„) лӮЁнҡЁмҳЁ(еҚ—еӯқжә«) м°¬(ж’°) 1971л…„
в—Ӣ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Җ мһҗк°Җ мӮ¬кі (её«еҸӨ)мҡ”, м•„лӘ…мқҖ н•ҷмқҙ(еӯёиҖҢ)мқҙлӢӨ. ліёкҙҖмқҖ мІӯмЈј(ж·ёе·һ)лЎң м„ңмҡём—җ мӮҙм•ҳмңјл©°, мӢңм—җ мЎ°мҳҲк°Җ мһҲкі лі‘мҳӨл…„м—җ 진мӮ¬лҘј н•ҳмҳҖлӢӨ.
в—ҺлҸҷк°Ғ мһЎкё° мғҒ(жқұй–ЈйӣңиЁҳдёҠ) ліёмЎ°м„ мӣҗліҙлЎқ(жң¬жңқз’ҝжәҗеҜ¶йҢ„) мқҙм •нҳ•(п§Ўе»·йҰЁ)1971л…„
в—Ӣ м •лҚ•(жӯЈеҫ·) м •л¬ҳл…„(мӨ‘мў…2, 1507)м—җ м°ёмқҳ мң мҲӯмЎ°(жҹіеҙҮзҘ–), н–үнҳёкө° мӢ¬м •(жІҲиІһ), мһҘм•…мӣҗ м •(жҺҢжЁӮйҷўжӯЈ) к№Җ к·№м„ұ(йҮ‘е…ӢжҲҗ), мғҒмқё(е–Әдәә) лӮЁкіӨ(еҚ—иўһ) л“ұмқҙ 비л°ҖнһҲ м•„лў°кё°лҘј,вҖңмқҳкҙҖ(йҶ«е®ҳ) к№Җкіөм Җ(йҮ‘е…¬и‘—), м„ңм–ј(еә¶еӯј) л°•кІҪ(жңҙиҖ•), мң мғқ мЎ°кҙ‘ліҙ(и¶ҷе…үиј”)мҷҖ мқҙмһҘкёё(жқҺй•·еҗү) л“ұмқҙ л°•мӣҗмў….мң мһҗкҙ‘.л…ёкіөн•„(зӣ§е…¬ејј)л“ұмқ„ н•ҙм№ҳл Ө н•©лӢҲлӢӨ.вҖқн•ҳлҜҖлЎң, лҢҖк¶җ лң°м—җм„ң көӯл¬ён•ҳлҠ”лҚ° лӮҷнҳ•(зғҷеҲ‘)мқ„ м“°кё°к№Ңм§Җ н•ҳм—¬ мһҗл°ұмқ„ л°ӣм•ҳлҠ”лҚ°, лҢҖмӢ л“Өмқ„ н•ҙм№ҳкі мЎ°м •мқ„ нҳјлһҖмӢңнӮӨл Ө н–ҲлӢӨн•ҳм—¬ к№Җкіөм ҖмҷҖ л°•кІҪмқ„ м°ёнҳ•(ж–¬еҲ‘)м—җ мІҳн•ҳкі , мҙҲмӮ¬(жӢӣиҫӯ)м—җ кҙҖл Ёлҗң мӮ¬лһҢл“ӨмқҖ л“ұкёүм—җ л”°лқј мң л°°(жөҒй…Қ)н•ҳмҳҖлӢӨ. мЎ°кҙ‘ліҙлҠ” лҢҖк¶җ лң°м—җ мһЎнҳҖмҷҖм„ңлҸ„ нҒ° мҶҢлҰ¬лЎң кёҖмқ„ мҷёмӣ мңјл©°, мң мһҗкҙ‘мқ„ ліҙкі лҠ” нҒ¬кІҢ мҷём№ҳкё°лҘј,вҖңмһҗкҙ‘мқҖ мҶҢмқёмқёлҚ°, м–ҙм°Ңн•ҳм—¬ мқҙ мһҗлҰ¬м—җ м•үм•ҳлҠҗлғҗ? л¬ҙмҳӨл…„м—җ м–ҙ진 мӮ¬лһҢл“Өмқ„ лӘЁн•Ён•ҳм—¬ н•ҙміҗм„ң к№Җмў…м§Ғ(йҮ‘е®—зӣҙ)кіј к°ҷмқҖ мӮ¬лһҢл“Өмқҙ лӘЁл‘җ нҷ”лҘј лӢ№н•ҳмҳҖлҠ”лҚ°, м§ҖкёҲ лҳҗ л¬ҙмҠЁ мқјмқ„ н•ҳл Ө н•ҳлҠҗлғҗ? мІӯм»ЁлҢҖ, мғҒл°©кІҖ(е°ҷж–№еҠҚ)мқ„ л№Ңл Ө к°„мӮ¬н•ң мӢ н•ҳмқҳ лЁёлҰ¬лҘј лІ м–ҙлІ„лҰ¬кі , м„ұкө°(иҒ–еҗӣ)мқ„ 추лҢҖн•ҳм—¬ м–ҙ진 м •мҠ№м—җкІҢ м •м№ҳлҘј л§Ўкё°л©ҙ нӣҢлҘӯн•ң м •м№ҳлҘј ліј мҲҳ мһҲмқ„ кІғмқҙлӢӨ.вҖқн•ҳмҳҖлӢӨ. м„ұнқ¬м•Ҳмқҙ 묻기лҘј,вҖңк°„мӮ¬н•ң мӢ н•ҳк°Җ лҲ„кө¬лғҗ?вҖқн•ҳлӢҲ, мЎ°кҙ‘ліҙк°Җ л§җн•ҳкё°лҘј,вҖңл°”лЎң мң мһҗкҙ‘мқҙмҳӨ.вҖқн•ҳкі лҠ”, л°•мӣҗмў…м—җкІҢ л§җн•ҳкё°лҘј,вҖңл„Өк°Җ м„ұкө°(иҒ–еҗӣ)мқ„ 추лҢҖн•ҳм—¬ л°ҳм •(еҸҚжӯЈ)н•ҳмҳҖмңјлӢҲ кіөмқҙ кіјм—° нҒ¬лӢӨ. к·ёлҹ¬лӮҳ м–ҙм°Ңн•ҳм—¬ 집м•Ҳм—җ нҸҗмЈј(е»ўдё»)мқҳ лӮҙмқё(е…§дәә)мқ„ лҚ°лҰ¬кі мӮ¬лҠҗлғҗ?вҖқн•ҳкі , лҳҗ м„ұнқ¬м•Ҳм—җкІҢ лҲҲ짓н•ҳм—¬ л§җн•ҳкё°лҘј,вҖңм „м—җ н•ңнӣҲ(йҹ“иЁ“)мқҙ л„ҲлҘј мқҙлҰ„лӮң м„ л№„лқј н•ҳмҳҖлӢӨ. м§ҖкёҲ м–ҙм°Ңн•ҳм—¬ мң мһҗкҙ‘кіј мқјмқ„ к°ҷмқҙн•ҳлҠ”к°Җ?вҖқн•ҳкі , лҳҗ мӮ¬кҙҖ(еҸІе®ҳ) к°•нҷҚ(е§ңжҙӘ)кіј мқҙл§җ(жқҺжҠ№)мқ„ к°ҖлҰ¬нӮӨл©°,вҖңк°•нҷҚм•„, л„Ҳмқҳ л¶Җм№ңмқҙ мЈ„м—Ҷмқҙ мЈҪмһ„мқ„ лӢ№н•ҳмҳҖлӢӨ. л„Ҳнқ¬л“Өмқҙ мӮ¬кҙҖ(еҸІе®ҳ)мқҙлӢҲ, л§Ҳл•…нһҲ лӮҳмқҳ л§җмқ„ нҠ№лі„нһҲ мӮ¬кё°(еҸІиЁҳ)м—җ мҚЁм•ј н• кІғмқҙлӢӨ.вҖқн•ҳл©°, кіӨмһҘмқ„ 10м—¬ лҢҖ л§һкі лҠ”, лӢӨл§Ң нҶөкіЎн• лҝҗмқҙм—ҲлӢӨ. л°•мӣҗмў…мқҙ л§җн•ҳкё°лҘј,вҖңм°ёмңјлЎң лҜём№ҳкҙ‘мқҙмқҙлӢӨ.вҖқн•ҳкі лҶ“м•„мЈјм—ҲлӢӨ. кі л°ңн•ң кіө(еҠҹ)мқ„ л…јн•ҳм—¬, мӢ¬м •.лӮЁкіӨ.к№Җк·№м„ұ л“ұмқ„ к°Җмһҗ(еҠ иіҮ)н•ҳкі , мң мҲӯмЎ°лҠ” мқјм°Қмқҙ к·ё мқҢлӘЁлҘј м•Ңкі лҸ„ мҰүмӢң кі л°ңн•ҳм§Җ м•ҠлӢӨк°Җ, мӢ¬м •мқҙ мһҘм°Ё кі л°ңн•ңлӢӨлҠ” кІғмқ„ м•Ңкі , к·ё мқјмқҙ л°ңк°Ғлҗ к№Ң кІҒлӮҙм–ҙ мһҗкё°мқҳ мЈ„лҘј л©ҙн•ҳл Өкі м•„лўҙ кІғмқҙлқј н•ҳм—¬, кіӨмһҘмқ„ л•Ңл Ө мӢ л¬ён•ҳкі л©ҖлҰ¬ к·Җм–‘мқ„ ліҙлғҲлӢӨ.
- Copyright(c) 2001 jhhan all right reserved. If you have any question. email to Webmaster
|
16
|
|
 |
|